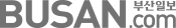불붙은 통영-여수 ‘최초 통제영’ 논쟁…영호남 갈등으로 번지나
- 가
통영시의회 ‘역사 왜곡 중단’ 결의문에
여수종고회 18일 기자회견 열어 반박
“한산도가 최초 통제영이란 근거 없다”
여수시의회도 재반박 결의문 체택 예고
 통영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침탈 행위 및 역사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산일보DB
통영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침탈 행위 및 역사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산일보DB
속보=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 최초의 본영이 어딘지를 놓고 불거진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 간 역사 논쟁(부산일보 1월 16일 자 11면 등 보도)이 점입가경이다. 여수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불붙인 ‘최초 타이틀’ 논란에 통영 지역 정치권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측 신경전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자칫 해묵은 지역감정까지 자극해 영호남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수 지역 향토역사문화단체인 (사)여수종고회는 18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시의회는 적반하장식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14일 ‘전남과 여수시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침탈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계 기관에 발송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삼도수군통제영은 1593년 한산도에 최초로 설치됐다”면서 “역사적 기록과 고증이 명백함에도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전남도와 여수시는 통영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국가유산청과 경남도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수종고회는 “각종 임진왜란 사료와 고증 자료 대부분에 ‘한산도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라 돼 있고 국가유산청 역시 통영을 최초 통제영이라고 인정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여수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라는 근거는 난중일기와 이충무공전서 등에 제시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한산도가 최초라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어 선조가 내린 교서(삼도수군통제사 임명장)를 제시하며 “통영이 최초라면 선조가 1대 이순신, 2대 원균, 3대 이순신, 4대 이시언을 경상우수사가 아닌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라좌수사와 좌수영 수군이 경상우수영 한산도에 비교적 장기간 주둔했다고 해서 전라좌수영이 경상우수영이 되지도 않고 전라좌수사가 경상우수사가 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여수시의회도 조만간 통영시의회 결의문을 반박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나아가 여수, 통영이 함께하는 학술대회도 제안할 예정이어서 최초 통제영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에 조선시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 세워진 곳으로 기술돼 있는 통영 한산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 집무실이던 ‘운주당’ 터에 사당인 ‘제승당’이 세워졌다. 부산일보DB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에 조선시대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이 세워진 곳으로 기술돼 있는 통영 한산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 집무실이던 ‘운주당’ 터에 사당인 ‘제승당’이 세워졌다. 부산일보DB
한편, 역사학계 등에 따르면 1592년(선조 25년) 한산대첩을 통해 제해권을 장악한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이듬해 해로 방어 최대 요충지인 통영 한산도로 군영을 옮겼다. 남해안 서쪽에 치우쳐 방어에 취약한 전라좌수영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후 초대 통제사로 제수돼 3년 8개월간 한산도에 주둔하며 경상·전라·충청도 수군을 통솔했다. 학계는 이를 근거로 한산 진영을 최초 통제영으로 인정해 왔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7년(1592년~1598년) 동안 군중에 쓴 <난중일기>를 비롯해 <이충무공전서>, <두룡포기사비>, <통제영충렬사기> 등 현존하는 임진왜란 사료와 근현대 고증자료 대부분도 ‘한산도는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게 학계 설명이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역시 ‘통제영이란 충청·전라·경상도의 삼도수군을 통할하는 통제사가 있는 본진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한산진영이 최초’라고 기술해 놨다.
그런데 작년 10월과 11월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가 ‘빼앗긴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 역사바로잡기 촉구 결의안’을 연거푸 채택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들은 △임진왜란 무렵에는 통제영이란 용어가 없어 ‘본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 △제1대 이순신부터 제4대 이시언 통제사까지 전라좌수사로 하여금 삼도수군통제사를 겸하도록 했다는 사실, 그리고 △한산도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기능을 지닌 임시 전초 전진기지로 병참, 군수물을 거의 모두 본도인 전라도에서 충당했다는 주장 등을 들어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은 전라좌수영 본영인 여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여수종고회, (사)여수여해재단, (사)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 등 시민단체가 가세해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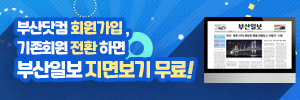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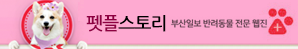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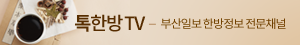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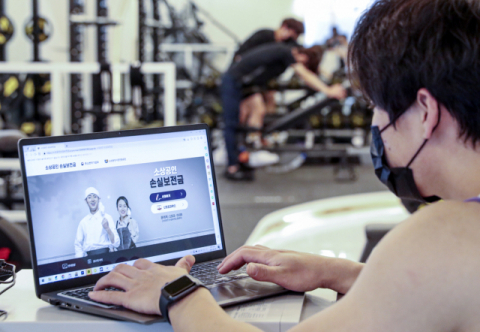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