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으로 세상 읽기] 30. 한민족의 오래된 미래 ‘조선왕조실록’
- 가
권력자의 성패 ‘불멸의 역사’가 판단한다
 2015년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서 조선왕조실록(태백산본)을 실록 맞춤형 전용서고로 옮기는 ‘실록 환안(還安)의식’이 거행되는 장면. 부산일보DB
2015년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서 조선왕조실록(태백산본)을 실록 맞춤형 전용서고로 옮기는 ‘실록 환안(還安)의식’이 거행되는 장면. 부산일보DB
지난 천 년간 한반도에서 나온 가장 대단한 책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500년에 이르는 장구한 시기와 함께 분량도 압도적이다. 일제하에 편찬된 고종과 순종 실록은 제외하고도 총 1893권 888책에 약 5000만 자의 한문으로 이뤄진 문자의 은하계와 같다. 그러나 조선은 망했다. 문명국이었지만 왜적에게 무너진 것이다. 소국이 대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위화도 회군이 건국의 원죄였던 만큼 망국은 당연하다는 것이 예언자 함석헌의 진단이었다. 그는 〈뜻으로 본 한국역사〉에서 사대주의로 탄생한 조선은 자기를 잃어버린 역사여서 당파로 쪼개지고 모순이 누적됐다며 ‘당쟁망국론’을 펼친다. 국권 상실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도를 넘어서면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으로 악용될 수 있다.
총 1893권 약 5000만 자의 한문
500년 방대한 역사 생생히 기록
사관 없이 국왕은 관리 못 만나
‘실록’ 통해 군주의 ‘욕망’을 순화
문치주의 성리학적 세계관 구현
북한 권력세습·남한의 재벌세습
왕조의 세습문화 지금도 되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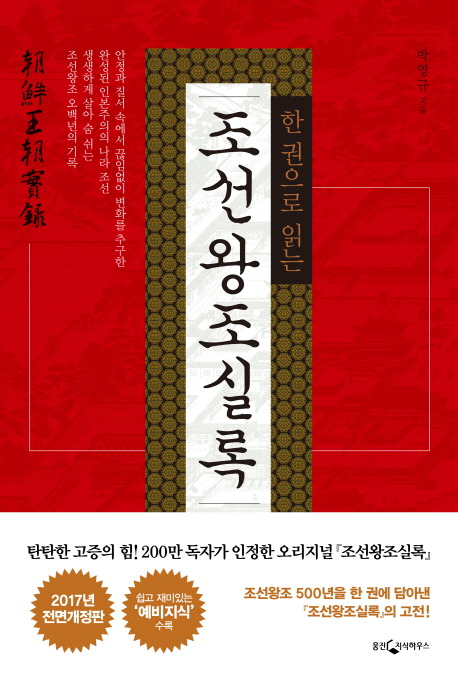
사관은 청와대 출입기자(!)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다큐멘터리다. 거기에는 국왕과 신하뿐만 아니라 선비와 농민, 상인과 도둑 등 온갖 유형의 인간들이 살아 숨 쉰다. 가족끼리 피를 뿌리는 권력의 무자비함과 아울러 궁정의 민낯을 몰래 들여다보는 쾌감도 있다. 지엄한 나라님의 속사정을 파헤치는 사관들은 청와대나 백악관 출입기자보다 몇 수 위다. 국왕이 사관 없이 관리를 만나기란 언감생심이었고 실록 열람 또한 금지됐다. 권력이 간섭할 수 없도록,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든 제도가 사관과 실록이다. 변방의 이무기 이성계가 용으로 승천한 데에는 정도전, 조준과 같은 성리학자의 도움이 컸다. 성리학의 근본 이념은 무엇인가. 성균관대 석좌초빙교수 미야지마 히로시에 따르면 ‘성인이라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이를 수 있는 것이다(聖人, 學而可至)’는 문장이다. 사람은 누구나 성(性)을 갖고 있다. 선천적으로 평등하다. 하지만 배움의 유무에 따라 지혜가 달라지고 현우(賢愚)가 생겨나는 것이다. 일급의 유학자인 신하들은 현군과 혼군을 판가름하는 것은 공부이니 군주에게 끊임없는 학습을 주문했다. 유교적 이상군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을 놓지 않는 독서인이다. 신하와의 세미나인 ‘경연’으로 권력의 폭주를 예방하고 역사의 제단에 올리는 ‘실록’을 통해 욕망을 순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문치주의라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구현하는 지름길이었다. 임금의 말 한 마디, 손짓 하나조차 놓치지 않는 사관들은 국왕의 승부처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불멸의 역사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무엇보다 조선은 중앙집권국가였다. 유럽이나 일본처럼 봉건제가 등장하기에는 국토가 좁고 산수의 경계가 험하지 않았다. 성리학의 친(親)평등적 성향은 양반과 상민을 양인이라는 범주로 묶었다. 현상을 유지하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요청되는 것은 권력자의 인품과 자질이다. 임금은 마음을 먹으면 수많은 사람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즉 조짐을 만들어내는‘짐(朕)’이기 때문이다. 야성의 본능은 학문으로 다스리고 내세의 욕망은 실록으로 교화된 왕이야말로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서양 사상가들이 고대하던 철인왕(哲人王)은 바로 이 땅에 머물렀다가 떠난 조선의 임금들 몇몇이었던 것이다.
위화도 회군은 경로의존의 덫
특히 ‘역사는 지나간 것의 결과가 아니라 장차 올 것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함석헌의 주장을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은 오래된 미래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위기에 처한 지금의 우리에게 그것 또한 역사적 패턴에 속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구원병을 보내준 명나라와 신흥강호 청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던 선조들의 고뇌와 갈등은 훌륭한 사례연구다. 19세기 조선을 둘러싼 청, 일, 러, 미의 쟁탈전은 21세기 현재에도 포장만 바뀐 채 진행 중이다. 대내적 차원에서 은감불원(殷鑑不遠)의 교훈도 적지 않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20세기 한국사회가 갇혔던 ‘경로의존의 덫’이다. 5.16 군사정변과 12.12 반란이 수백 년 뒤 되풀이된 것은 교훈을 얻을 때까지 되풀이되는 역사의 무서운 섭리가 아닌가. 게다가 아무리 역성혁명으로 포장했지만 권력투쟁의 ‘빅뱅’은 일회적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창업군주는 ‘왕자의 난’에 휩쓸려서 둘째 부인에게 얻은 아들 둘과 사위를 잃고 딸은 비구니가 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권력의 마력에 중독된 결과, ‘적장자 우선’의 유교적 지배이념을 스스로 내팽개친 후과였다. ‘구악일소’와 ‘정의사회’를 표방하면서도 그것을 뒤엎은 군사정권들의 자가당착도 비슷한 궤적을 보여준다. 실제로 쿠데타의 주역들은 공통적으로 내분이 심각했으며 측근이나 후계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사실 현재의 거울이 되어주는 실례는 〈조선왕조실록〉에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읽을수록 떠오르는 단어는 ‘세습’이다. 북한의 권력세습이나 남한의 재벌세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참으로 기괴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어디서 왔는지 일러준다. 공화국에서 살아간다는 우리가 아직 왕조사회를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 -끝-

정승민
교양 팟캐스트 ‘일당백’ 운영자
※이번 기획은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연재합니다.
김상훈 기자 neato@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