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대통령'이라는 발명품
- 가
김마선 정치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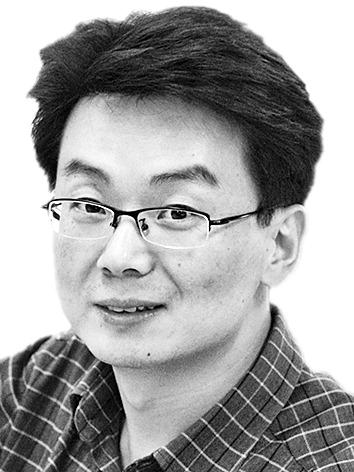
‘왕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이른바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설계할 때 했던 큰 고민이다. 많이들 알듯이 미국은 시민혁명을 통해 왕이 다스리던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해 건립됐다. 군주제에 대한 반감은 당연했을 것이다. 여기에 명예혁명 이후 막강한 권한을 누리던 의회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았다. 입법부(의회) 독재와 행정부 수반의 전제군주화를 어떻게 막을지 그들은 궁리했고, 그렇게 세계 최초로 발명된 것이 바로 대통령이다.
‘짐이 곧 국가’인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을 움켜쥐고 백성 위에 군림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면서 우선했던 원칙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였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아래 국민 대표성이 강하고, 국민에게 잘 봉사할 도구를 생각했던 것이다. 나라의 주인이 왕에서 국민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혁명적’ 변화다.
의회독재와 행정수반 전제군주화
함께 차단하기 위해 미국서 발명
정치 안정, 강력한 리더십 발휘
남북 분단과 근대화 과정서 역할
지도자는 결국 봉사하는 사람
주인되려면 후보 자질 잘 따져야
여기까지가 이화여대 사학과 조지형 교수가 쓴 <헌법에 비친 역사>(푸른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우리와 미국의 정치 체제를 헌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책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한 대한민국도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오랜 민주화 과정을 거쳐 1987년 직선제를 쟁취했고, 이제 곧 스무 번째 대통령을 맞는다.
우리는 이 즈음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 같다. 대통령을 뽑으면서 우리는 과연 행복했던가.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와 변화에 대한 기대로 충만한가. 우리는 과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윤석열 당선인은 이에 대해 응답할 의무가 있다. 자신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도구’임을 되새겨야 한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머슴’이다. 국민은 지지와 심판 사이에서 예의 주시한다. 그것이 ‘국민의 힘’이다.
대통령제는 다른 권력구조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대통령 임기 동안 정치적 안정을 누리면서 강력한 지도력으로 빠르고 과단성 있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우리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정치적 안정이 중요했고, ‘근대화’를 위해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했다.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이끄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민주적 대표성도 높다. 국민이 직접 뽑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래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있다. 왕 대신 만든 것이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아이러니다. 지방의 입장에서 보자면 천년 이상 이어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탈피하려는 분권 요구이기도 하다. 이런 비판은 대개 국회에서 나오는데, 의회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을 발명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두 권력 간 질긴 애증으로 볼 수 있겠다. 대통령 후보가 을(乙)의 처지인 선거 국면에 비판이 부각되기도 한다.
대통령들은 정반대의 푸념을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로 나뉜 ‘이중 권력’ 탓에 소신껏 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여대야소’를 만들거나, 때론 국민들이 그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런 아쉬움은 노무현 대통령 재직 때 대통령비서실에서 낸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역사비평사)에 잘 나와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여소야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기회라고 밝혔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지키되, 1987년 체제(9차 개헌)를 넘어 대안이 뭘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 개헌 등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발 물러서 권력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간디는 “리더는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빅히스토리 관련 책들에서 다뤘듯이 인류는 농업혁명을 통해 생산을 발전시켰고, 집단이 커지자 지도자가 생겨났다.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은 지금도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 과정에 권력은 수단이고, 유인이다. 권력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권력의 본질은 ‘폭력’이고 ‘공포’다(엘리아스 카네티). 권력은 남이 싫어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다. 봉사를 위해 권력이 필요하지만, 행사 과정이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키아벨리 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목적(봉사)을 위해 나쁜 수단(폭력)도 쓰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가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유일하게 합법적 폭력을 휘두르는 곳이다(막스 베버). 지도자를 뽑을 때 봉사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정당한 범위를 넘어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어쨌든 대선은 끝났다. 이제 지방권력을 향한 쟁투가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치자면 지방선거도 대선 못지 않다. 당신이 ‘주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봉사정신이 조금이라도 나은 인물을 골라야 한다. 당신의 한 표에 ‘민주(民主)’의 오랜 역사가 숨쉬고 있다. ms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