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쪽과 저쪽, 삶과 죽음 사이의 팽팽한 긴장”
- 가
김형술 ‘사이키, 사이키델릭’
중환자실서 접한 경계의 지점
일곱 번째 시집에서 녹여내
 일곱 번째 시집 <사이키, 사이키델릭>을 출간한 김형술 시인은 중환자실에 누워 어머니 황망한 그림자를 봤다고 한다. 김형술 제공
일곱 번째 시집 <사이키, 사이키델릭>을 출간한 김형술 시인은 중환자실에 누워 어머니 황망한 그림자를 봤다고 한다. 김형술 제공
몇 년 전 그는 느닷없는 복병을 만났다. 한 문학 행사에 약속한 기타·노래 연주에 앞서 갑작스럽게 내장 천공으로 수술했다. 이듬해 연말 퇴근길에 그는 도시철도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됐다. 수술한 부위의 내출혈이 의심됐다. 그러나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해 혈압이 떨어져 수혈하면서 중환자실에 보름간 누워있었다. 이를테면 갑자기 어떤 경계 지점에 이른 것이다.
그는 “이쪽과 저쪽, 삶과 죽음 사이의 팽팽한 긴장을 시”라고 말한다. 김형술 시인의 일곱 번째 시집 <사이키, 사이키델릭>(시와반시)은 그 경계의 팽팽한, 몽환적(사이키델릭) 경험을 담으려 했다. 도시철도에서 쓰러진 뒤 그는 ‘벨트에 묶여’ 발을 시리게 내놓고 앰뷸런스에 실려갔다. ‘바퀴 달린 침대’에 실려 ‘행렬의 끝이 보이지 않’는 ‘헝클어진 시간 속으로 빠’(123쪽)졌다. ‘비명소리 잠잠해지고 마침내 발끝에 아무것도 닿지 않을 즈음 몸을 감싸는 평화, 완전한 침묵’(108쪽),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한다.
팽팽한 경계에서는 이쪽과 저쪽이 다 보이는 법이다. 그는 ‘불이 꺼지지 않’고 ‘거울도 창문도 없이 출입구 하나만 있는’(100쪽) 중환자실에서 죽어 나가는 이들을 많이 봤다. ‘무덤덤하게 죽음은 찾아와 침대 바퀴를 굴려 문을 열고 문밖 세상으로 나간다’(101쪽).
문밖 세상, 죽음 이쪽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갈아 끼우고 싶은 ‘찢어져 너덜거리는 혀’(97쪽)의 삶이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곁을 살피’는 ‘저 간교한 눈빛들’(38쪽)의 ‘쥐새끼’(90쪽) 같은 삶이다. ‘조장(鳥葬)’은 그런 쥐새끼 같은 삶을 파먹어달라는 기원의 시다. ‘우레처럼 달려와 내 눈을 파먹어다오 (중략) 내 심장을 움켜 낚아채 가다오 (중략) 함부로 취하고 노래하다/흐려진 눈, 남루해진 혀/기꺼이 너의 허기에 바치려 하니’.
김만중이 <구운몽>을 통해 일깨운 것처럼 우리 삶은 일장춘몽이다. 그의 시어들에 따르면 삶의 불안, 상투적인 반성, 넥타이, 구두, 지갑, 지위, 야망, 권력…, 그 모든 것은 너덜거리는 것이고, 한 조각 구름 같은 것이다. 그는 구름을 ‘절대자의 그림자’(11쪽), ‘신들이 허공에 써놓은 문장이다’(14쪽)라고 쓴다.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것은 뭘까. 시인은 중환자실에 누워 ‘나를 찾아오는 내 얼굴, 너무도 뚜렷한 얼굴’을 느꼈단다. 그것은 ‘까무룩한 의식 속으로 걸어오고 걸어오다 흩어지는 어머니 황망한 그림자’(101쪽)였다. 돌아가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 세상에 우리를 탄생시켰고, 여전히 우리의 목숨줄을 지키고 계신 것이다. 생사의 팽팽한 긴장이 시라면, 그것은 어느새 어머니에 가닿는 것이다. 어머니가 지키시는 우리 삶이 간교한 쥐새끼 같고, 찢어져 너덜거리는 혀와 같다는 비극성. 그의 시는 그 점을 아프게 드러내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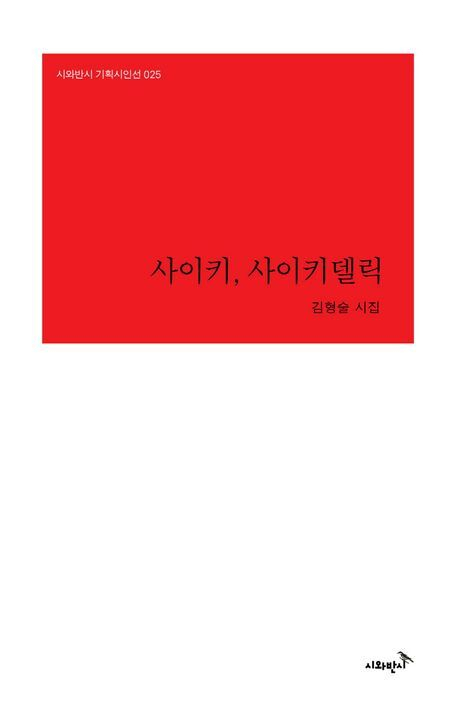 김형술 시인의 일곱 번째 시집 <사이키, 사이키델릭>. 시와반시 제공
김형술 시인의 일곱 번째 시집 <사이키, 사이키델릭>. 시와반시 제공
최학림 선임기자 theos@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