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멋의 말이 아니라 함축과 침묵이 필요한 시대
- 가
이우걸 시인 등단 50년 시조집 ‘이명’
넘치는 말 속 ‘소통 실종’ 꼬집어
쓸데 없이 들었던 것에 귀 닫고
생채기의 울음마저 들으려는
두 의미의 ‘이명’ 시어로 포착
구구한 말 아닌 마음과 온기 절실
 이우걸 시조시인. 부산일보 DB
이우걸 시조시인. 부산일보 DB
시조의 새로운 가능성은 장광설을 넘어서는 ‘함축’에 있지 않을까. 소통 부재의 ‘말 많음’ 앞에서는 귀가 울린다. 창원시에 사는 이우걸 시조시인의 등단 50년 시조집 <이명>(천년의시작)은 말 많으나 외려 소통이 실종된 세태를 꼬집고 있다.
코로나 시절, 우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감추고’ 다녔다. 마스크는 ‘오만한 인간을 향해 누가 창을 던진 것’이다. 그러나 ‘한때의 자만이/저지른 형벌임을/아무도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마스크에 가려져 ‘입이 없’(36쪽)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말 많은 입이 없는 게 나을까. ‘곳곳에 귀를 대고 얻어낸 소식을/대단한 전리품인 양’ 입은 떠벌이기 일쑤다. 쓸데없이 들었던 것들, ‘그것이 울음이 되어/스스로 닫으려’(34쪽) 하는 것이, 시인이 역설적으로 포착한 ‘이명’이다.
시인은 함축적 풍경을 꿰뚫어 보고, 새로운 소리를 들으라고 일갈한다. ‘초승달’은 처연하게 빛나는 것이다.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누명을 애소하는 달’로서 ‘허공에’(38쪽) 걸려 있다. ‘억새’는 우는 것이다. ‘저무는 하늘을 휘젓는 갈필들//박토를 물고 견뎌 온 민초들의 입말이다//쫓기며 살아온 생의//칼끝 같은//상소문이다’(19쪽). 그런 걸 보지 못하고 못 들으니 ‘울음은 울어서 그 울음을 이기려는 것’(44쪽)인 듯 귀뚜라미가 그칠 줄 모르고 우는 것이다.
그때 시인의 귀가 울린다. ‘생의 언덕바지에 목 쉰 파도가 산다//파도는 사연 많은 생채기의 울음들이다//그 소리 다 읽고 싶어//귀는 늘 잠이 없었다’(24쪽). 차마 다 듣지 못한 그 생채기의 울음을 마저 들으려는 것이 또 다른 ‘이명’이라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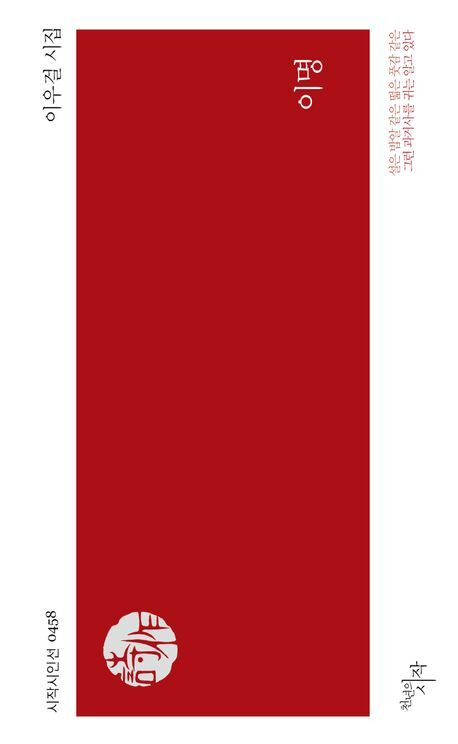 이우걸 시조십 <이명>. 천년의시작 제공
이우걸 시조십 <이명>. 천년의시작 제공
사람은 저마다 ‘빗살무늬’를 새기며 산다. ‘우리 삶의 뒷골목에는 늘 그늘이 살고 있다/그것들의 어딘가에는 빗살 무늬가 새겨진다/격랑을 이겨낸 자의 뜨거운 심전도 같은’(54쪽).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삶은 별것 아니다. ‘낙엽’ 같은 것이다. ‘가쁜 숨결과 외로움이 배어 있다//사는 게 다 그런 거라고’(83쪽).
1946년생 시인은 ‘자화상’을 그린다. ‘사변을 만나고, 기아에 허덕이고, 독재를 만나고, 시위에 휩싸이고/내 생이 스친 역들은/늘 그런 화염이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안 보였다’고 한다. 대신 ‘맞은편 신호등 앞에/한 노인이 서 있었다’(46쪽)는 것이다.
그 노인은 ‘12월 남강휴게소 커피 자판기 앞’에 있었다. ‘‘먼저 드시지요’/젊은이가 잔을 건넨다/‘아니, 시간 있는데?’/웃으며 받아 든 노인’(60쪽). 웃으며 받아 들 수 있는 ‘온기 한 잔’이 우리가 지금 나눠야 할 것의 하나다. 더 머금어지고 함축돼야 한다는 거다. 구구한 말이 아니라 온기, 마음이 필요하다. 이명의 세태 속에서 함축, 침묵이 필요하다.
최학림 선임기자 theos@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