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단상] "저 언론은 해로운 언론이다"
- 가
권상국 사회부 경찰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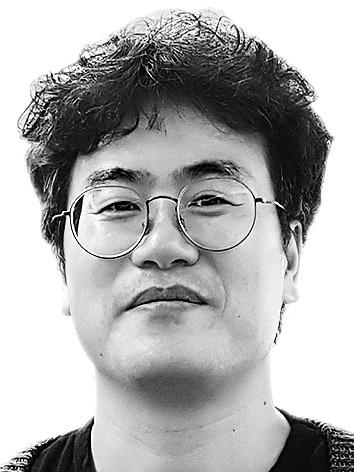
신참 기자 시절 중국에 출장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부산의 지역 간 교류행사로 기억합니다. 미리 도착한 환영식 현장에서는 행사를 맡은 공산당 간부의 손짓에 따라 방송 카메라가 배치되고, 취재 기자가 몰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한국 언론도 저렇게 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보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현장에 동행했던 한 공무원의 장탄식은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물론 그날의 기억은 ‘그럼 중국에 남아서 사시면 되겠네요’라는 기자의 핀잔 섞인 농담으로 끝이 났습니다.
10년도 더 된 그 출장의 기억이 불현듯 떠오른 건 정국을 달구고 있는 언론중재법 때문입니다. 여당이 밀어 붙이는 언론중재법의 종착역이 그날 본 중국의 행사 풍경이 아닐까 느낀 탓이겠지요. 사소한 국제행사 하나까지도 관제 보도가 이루어지는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말하자면 입만 아플 게 아니겠습니까.
1958년 중국에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인다며 ‘대약진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감추고 싶은 흑역사 중 하나죠.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는 마오쩌둥의 교시 한 마디에 해충을 잡아먹던 참새는 한순간에 ‘농사 적폐’가 됐습니다. 그 해에만 중국 전역에서 2억 마리가 넘는 참새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참새가 해로운 새라는 근거가 뭐냐, 교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지요. 아니, 못 했지요.
당연히 천적이 사라진 논과 밭은 해충이 들끓었고 세계사에 길이 남을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아사자만 2000만 명에 넘었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돌고 돌아 코로나 시국에 당도했습니다. 2년 가까운 방역에 지칠 대로 지친 세계가 도끼눈을 뜨고 중국을 노려보는 형국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연일 태연하고요. 잔뜩 덩치만 키운 관제 언론을 통해 중국은 이달에도 ‘코로나19가 미국의 전자담배에서 비롯됐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 판인데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유아적인 행보를 지적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이미 당과 언론이 한 몸으로 ‘중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어떤 이성적인 비판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중국 인민에게 전세계적으로 제재와 박해가 쏟아질 테지만 관제 보도에 둘러싸인 그들 중 비극을 예상할 수 있는 이는 극소수일 겁니다.
국내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개최한 국회의원 워크숍이 화제입니다.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 ‘아시아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높다’ ‘발 빠른 비상 대응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했다’ 등 해괴한 자화자찬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워크숍 자료집 제목은 무려 ‘팩트로 보는 문재인 정부 4년, 주요 정책 성과’. 저걸 팩트라고 하니 언론중재법을 강행한 여당이 어떤 언론을 원하는지는 원숭이가 아닌 다음에야 알 법합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로 사회부 기자들의 손발은 묶인 지 오래입니다. 이젠 정부와 여당이 뉴스 감별사 노릇까지 자처하니 그저 현장에선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만 맴돌 뿐입니다. ksk@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