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상 국가 독일’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다
- 가
독일은 왜 잘하는가 / 존 캠프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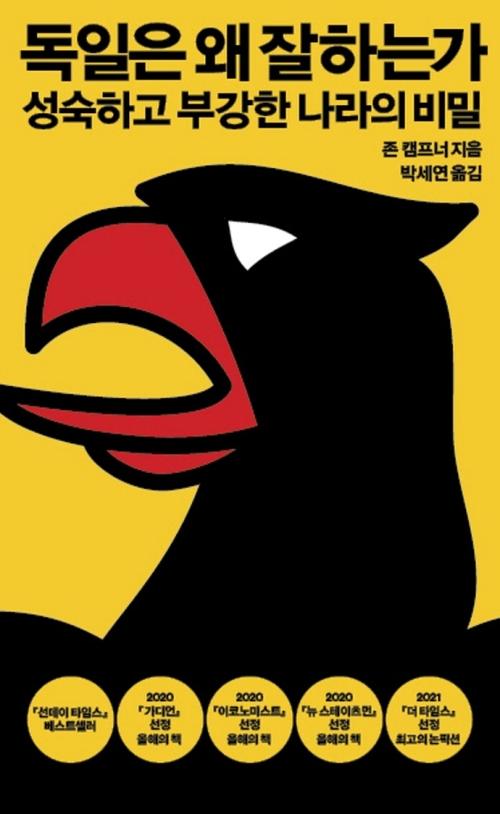
궁금한 책이다. <독일은 왜 잘하는가>는 독일이 ‘세계 최상 국가’인 이유를 영국의 국제평론가가 현지 취재를 통해 풀어낸 책이다. 독일은 최근 코로나 위기를 심하게 겪었으나 무엇보다 패전 독일, 통일 독일의 혼란을 극복해 온 곳이다.
맨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독일이 문화 국가라는 점이다. 철학과 클래식의 나라여서 그럴까. 독일의 신문 평론은 매우 수준이 높고, 예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강력하고 지속적이다. 예술단체가 기금 모금을 위해 시간과 예술가 정신을 뺏기지 않는 곳이 독일이다. 2013년 브렉시트 논란 당시 독일 총리 메르켈이 영국 총리 캐머런을 만났을 때 오페라 연극 전시를 말하면서 영국 가면 무엇을 보면 좋을지 물었다. 캐머런은 말을 더듬으며 그냥 TV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인구 300만 명에 불과한 작센 지방에 세계적 오케스트라 2개가 있는 곳이 독일이다.
국제평론가, 독일 경쟁력의 비밀 밝혀
전후 서독 지도자 대부분 뛰어난 인물
빌리 브란트, 헬무트 콜, 메르켈 대표적
과거사 반성 등 5가지 ‘잘하는 이유’ 꼽아
다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독일 수도는 국가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다. 수도의 GDP 비중을 보면 파리 15%, 런던 11%인 데 반해 베를린은 0.2%다. 독일 평균에 못 미치는 곳이 수도 베를린이다(서울은 2019년 22.6%). 우리로선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 곳이 독일이다. 2008년 베를린 근교 템펠호프 공항이 문을 닫았다. 부산시민공원의 6배 넓이 정도가 되는 이곳은 현재 공원으로 거의 방치돼 있다. 이름이 ‘템펠호프 프라이하이트(자유)’다. 2014년 이곳에 대한 개발 찬반 투표를 했는데 3분의 2가 그대로 두자는 의사를 표시했다. 현재 이곳은 세계 각국 난민의 최대 피난처라고 한다.
독일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첫째 규칙에 대한 강박이 있다고 한다. 새벽 교통 신호위반에도 딱지를 떼고, 일요일 점심시간 1시간여 이웃 노인들을 위해 일체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는 ‘루헤자이트’라는 의무 시간까지 있는 사회다. 몹시 더러운 차를 길에 세워두면 ‘거리를 위해 세차 좀 해주세요’라는 손편지가 와이퍼에 끼워져 있는 곳이 독일이다. 둘째 독일은 함께 뭉치는 사회라고 한다. ‘케어보헤’라고 부르는, 1년에 일주일 동안 실시하는 ‘지역민들의 지역 청소 주간’도 있다. 100만 명이 소방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각종 취미활동을 위한 사교클럽이 2016년 40만 개를 넘었다는 나라다. 그만큼 ‘단단한 사회’라는 거다.
이런 사회적 결속이 가능한 것은 사회적 시장주의가 뿌리 내린 사회이기 때문이다. 대기업 감사위원회 의석의 절반이 노동자 대표다. 1949년 만든 기본법(헌법)은 세계적 성취로 꼽힌다. 독일인들의 애국심은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애국심’이라고 한다. 독일인들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헌법과 국가의 역할을 떠받는다.
저자는 세부적으로 독일이 잘하는 이유 5가지를 꼽는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 이민 수용, 환경에 대한 관심, 외교 정책, 문화에 대한 지원이 그것들이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그 역사를 보면 1968년 학생 운동을 거치면서 젊은 세대가 주도했다고 한다.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또는 과거사 반성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68세대 젊은이들이 독일과 기성세대의 반성을 촉구했다고 한다. 1978년 미국 NBC 미니시리즈 ‘홀로코스트’가 독일을 강타하면서 반성의 기류가 거세졌다고 한다. 메르켈은 잘못된 과거사를 기억하고 그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독일의 절대 끝나지 않을 의무’이자 ‘국가 정체성의 일부’라고까지 했다.
그렇다.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다. 전후 독일은 ‘0년’에서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 지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총 8명에 이르는 전후 서독 지도자 대부분은 뛰어난 인물이었다. 아데나워는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고 대서양 동맹을 추구했고, 빌리 브란트는 냉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며 ‘무릎 꿇은 독일’의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했다. 헬무트 콜은 강력한 의지와 노련한 수완으로 통일에 박차를 가했고,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당에 큰 부담을 지우고 정권을 뺏기면서까지 급진적 경제 개혁을 완수했다. 그리고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16년간 재임한 ‘무티(엄마)’ 메르켈이 있었다. 독일에는 국가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시민의 용기’ ‘시민의 의무’를 가슴에 새긴 국민/시민들이 있었다고 한다. 함께 뭉치는 공동체 사회, 그것이 독일이라고 한다. 존 캠프너 지음/박세연 옮김/456쪽/2만 3000원.
최학림 선임기자 theos@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