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할마·할빠'를 응원하며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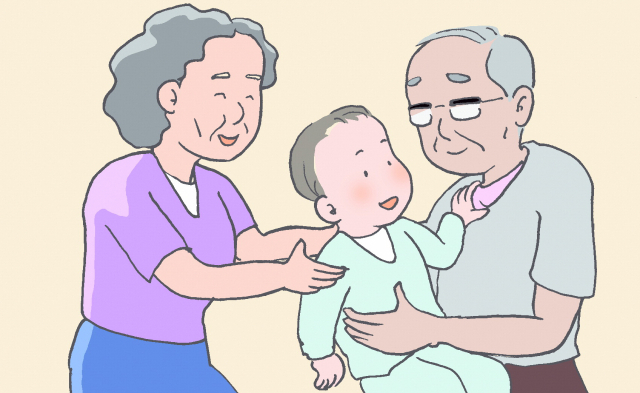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에 맞춰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 있는 할머니·할아버지의 모습은 이미 흔한 풍경이 됐다. 맞벌이하는 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소위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의 ‘황혼 육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이나 학교 선배들과 근황을 나누다 보면 손주를 키우기 위해 서울 자녀 집 근처로 ‘황혼 이사’를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들린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는 할머니가 부쩍 눈에 띌 정도로 육아를 넘어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는 슈퍼 할마·할빠, 즉 ‘학조부모’도 급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영유아의 70% 이상이 할아버지·할머니의 돌봄을 받고 있고, 부모가 아이를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맡기는 경우 84%가 (아이) 조부모에게 맡긴다고 한다. 2019년 한 해 노년층이 따로 사는 손주를 돌보는 데 투입한 노동가치만 3조 원을 넘겼다는 통계청 발표까지 나올 정도다. 맞벌이 부모 입장에서도 집에 잘 모르는 베이비시터를 들이거나 CCTV 설치 대신, 혈육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 ‘성공한 워킹맘 뒤에는 할마·할빠가 있다’는 말이 공공연한 상황이다.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가 학교 성적과 신체 발달이 좋고, 성인이 된 후의 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공식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황혼 육아를 공식 노동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육아휴직을 근로 중인 조부모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3대가 거주하는 가구에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런 시대상을 반영해 ‘기질을 고려한 손자녀 양육법’ ‘손주와의 정서 교감’ 등 조부모 특강 프로그램까지 마련되고 있다.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진 할마·할빠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이 ‘엄마가 다 키워줄 테니 너는 낳기만 해’라는 개인 희생에 기댈 상황은 아닌 듯하다. 부산 합계출산율 0.64명 시대에 도시는 물론이고, 국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쯤이면 국가가 아이를 맡아서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친정 엄마가 없었으면 아이 낳을 엄두도 못 냈다”는 한숨 소리가 ‘응~애’하는 탄생의 기쁨을 덮어버리지는 않을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 꼴이 무척이나 암담하다.
이병철 논설위원 peter@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