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산문학관 디지털 시대 큰 그릇 돼야
- 가
박하 부산시인협회 편집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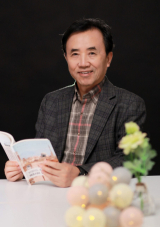
부산문학관은 부산문학인들의 숙원이다. 그동안 달팽이 걸음처럼 느리던 행보가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월 24일 금정문화회관에서 ‘부산문학관 바른 건립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고, 주최는 부산문학관 건립 정상화 대책위원회와 부산지역문학단체 일동이었다.
이날 김종회 교수(황순원문학촌 촌장)는 황순원문학촌의 건립 과정을 소개하며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했던 초기의 고군분투기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문학관 하나 세우고, 지역에 뿌리내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또한 최소 100년을 지속한다는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그분의 경험담과 포부는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남송우 고신대 석좌교수(전 부산문화재단 대표) 역시 지난 20년 동안 부산문학관을 위해 힘써온 과정과, 부산이 제2, 제3의 ‘한강’을 탄생시키는 터전이 되길 바라는 소망을 전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정문화회관 옆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적지 않았다.
이제 부산문학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필자로서 몇 가지 바람을 제시해 본다.
첫째, 디지털 아카이브가 물리적 공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부산의 문학 자산은 황순원문학촌이나 요산문학관과는 차원이 다르게 방대하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한정된 공간에 모두 담기란 불가능하다. 설령 다 담았다고 한들 어떻게 보여줄지도 문제다. 하지만 디지털 아카이브는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전자책이 주류가 된 시대와 디지털 원주민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물론 종이책의 향기를 사랑하는 독자들도 여전히 많다. 그러나 40대 이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독서 도구이고, 빠르게 대세를 이룰 것이다. 젊은 세대와 글로벌 독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종이책 전시보다는 e북, 오디오북, 그리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문학관은 ‘거대한 성채’가 아닌 ‘콘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 문학관은 반드시 웅장할 필요가 없다. 시민공원이나 도서관 내 아담한 공간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핵심 역할은 디지털 공간에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크기가 아니라, 문학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시민과의 밀접한 접점에서 문학 행사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산 문학을 국내외로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부산은 이미 국제적인 도시다.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는 비아냥은 천만부당하다. 부산의 글로벌 비즈니스 공간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의 말이다. 부산신항, 벡스코, 부산국제영화제, 해운대 북극곰 수영대회 등을 모르는 이들의 말이다. 결론적으로 부산문학관은 부산만의 개방성, 국제비즈니스 감각에 어울리는 무대, 부산 특유의 한류 문학의 발신지가 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구축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부산 작가들의 작품이 번역되어 해외에 소개되고, 국내외 문학인들이 교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부산문학관이 ‘디지털 시대 문학의 큰 그릇’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