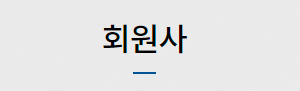[이재희의 디지털 광장] 누군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
- 가
국민 대다수 정보 유출 쿠팡 사태
이익에만 혈안 고객정보 관리 소홀
초정보화 디지털 시대 민낯 노출
정보 가치 공유하던 과거 있었지만
지금은 범죄조직 먹잇감 사적 자산
디지털 취약성 바른생활로 정면 돌파

지난 일요일 오전 ‘쿠팡’으로부터 두 번째 문자가 왔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해 재안내 드립니다.’란 제목의 메시지였다. 11월 29일 첫 번째 문자의 제목은 ‘쿠팡 개인정보 노출 통지’였다. 최근 문자의 주요 내용은 ‘예상 범행 수법’과 ‘조치 방법’으로 세분했다.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접근하더라도(지인일 것 같아도) 피싱범일 수 있음에 유의하란 문장이 가장 무서웠다.
3370만 개(대한민국 15~64세는 3591만 명)의 고객 계정이 유출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내역 등이 털린 이 초유의 사태는 초정보화 시대의 민낯을 그대로 노출한 희대의 사건이다. 사회적 파장도 어마어마해 호사가들은 연이어 터진 연예인 과거 사건 등과의 관련성을 유추하기도 한다. 이른바 ‘쿠팡 사태’의 화제를 돌리기 위한 여론공작설 주장이다. 여러 말들이 많아도 당연히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기업의 허술하고 안이한 개인정보 관리 문제이며, 이것을 단죄하고 또 예방하는 것이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해 연만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다. ‘포털에서 검색하듯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회원 가입해서 유료 버전을 써 보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분이 질문했다. “혹 그렇다면 똑똑한 AI에게 내 개인정보를 다 주게 되면 나중에 신상이 노출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위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름과 전화번호, 메일 주소 정도로 신상이 다 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보안이 잘돼 있을 것이다. 그래도 얻는 게 더 많다”라고 했지만 더 마땅한 답이 없어 서둘러 대화를 마쳤다.
어느덧 ‘라떼족’이 되어 말을 꺼내기가 죄송하지만, 한때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시절이 있었다. 시골에는(도시도 엇비슷했겠지만) 농협에서 만든 전화번호부가 집집마다 있었다. 면, 동, 리 작은 마을 단위로 세분화된 책자에는 주민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세세하게 적혀 있다. 그 뒤로 휴대폰의 보급이 늘자 발 빠르게 휴대전화 번호까지 기재한 농협전화번호부는 인기였다. 아무도 그 개인정보의 공유에 대해 시비 걸지 않았다.(아파트 사는 데 태양광 설치하라는 광고전화가 가끔 오긴 한다)
집집마다 걸려 있었던 문패도 어찌 보면 개인정보의 버젓한 노출이다. 요즘 분위기라면 아파트 현관문에 부부의 이름이 게시되는 걸 좋아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시절은 그랬다. 문패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다. 20대 때 이야기다. 같이 술을 먹던 친구가 최근 다투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고 했다. 단 한 번 집 근처까지 바래다줬단다. 대여섯의 청년들이 부산 남구 어느 주택가를 샅샅이 뒤졌다. 여자친구가 희성이라 문패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술 취한 우리들만의 착각이었다. 몇 군데 초인종을 눌렀다가 호되게 야단만 맞고 돌아섰던 기억이 난다. 114 전화번호부의 효용성을 당시 알았다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전국 인명 전화번호부가 예전엔 흔했다. 12월 31일 밤 친구들과 둘러앉아 서울 전화번호부를 무작위로 펼쳐가며 전화비를 축낸 장난을 한 적도 있다. 오로지 서울 말씨를 들어보기 위해서다. 그날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로 모르는 사람과도 통화할 수 있었다. 현재의 시점으로 본다면 다분히 미친 짓이다. 30도만 각도를 틀어도 화면의 차폐 기능이 작동하는 보안필름을 장착한 휴대폰이 대세인 시절이니 격세지감이다.
이제는 개인정보가 무척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정보의 가치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손안의 모바일로 주식 거래도 하고 예금도 하고, 인출도 하고, 상거래도 하는 세상이어서 개인정보는 절대 노출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심지어 전화번호조차 말이다. 취재원에게 흔히 명함을 주는 기자지만 어쩌다 모르는 전화가 오면 긴장한다. 특히 항의성 전화이면 ‘이 번호(나의 개인정보를 강조)를 어떻게 아셨냐’고 되받아 호통친다.
사실상 전국민의 정보가 유출되는 디지털 사회. 끔찍하다. 범죄를 저지른, 예방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단죄는 기본이다. 그런데 모든 사기 범죄가 그렇지만, 개인정보는 가공의 과정을 거쳐 범죄에 사용된다.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전화받는 이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뒤 사기친다. 보이스피싱이 그렇고, 최근 끔직한 전모가 드러난 해외 신용 사기 스캠 범죄가 그렇다. 범죄의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취약성 때문에 사기당하지 않을 현명함도 이제는 필요하다. 걱정된다고 폰뱅킹을 하지 않거나 아파트 월패드를 가리는 등 마냥 빗장만 걸고는 살아갈 수 없다.
누가 몰래 들여다보아도 떳떳한 삶, 허위와 기만에 속지 않을 강단. 그래 제발 속지 말자. 그리고 천만금 공돈을 준대도 흔들리지 않을… 그래 내 정보 잘 훔쳐가라 이 나쁜 놈들아.
이재희 디지털국 국장 jaehee@busan.com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