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에세이] 수상한 '시월'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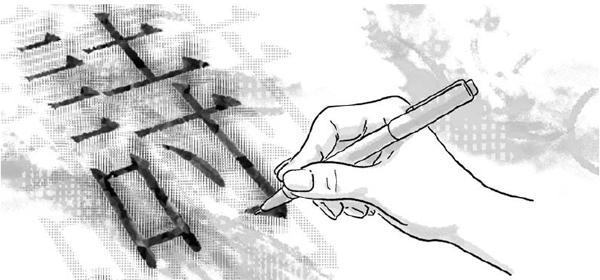 삽화 = 류지혜 기자 birdy@
삽화 = 류지혜 기자 birdy@"선생님은 인상은 좋은데 히히, 관상이 좀 별로예요."
3시간 연강 중 잠시 쉬는 틈을 타서 학생 한 명이 툭 내던지는 말. 무심하게 넘기기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쓰인다. 틈만 나면 지렁이젤리 과자를 입에 물고 있는 녀석이다. 조금 전 '시 창작 실습' 수업 중에 첨삭한 그 녀석의 시 제목이 '관상'이었다. 시와 영화를 결합한 영화시를 쓰고 싶다고 했다. 시와 영화의 결합이 매끄럽지 못하고 제목이 내용과 어우러지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지적한 것에 대한 보복은 아닌지, 속 좁은 생각이 잠시 스친다.
그 녀석은 따로 연구실로 찾아온 적이 있었다. 부모님 생사는 알 길 없어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착하게 자랐는데, 할아버지가 관상을 잘 보셨다 했다. 서당개 삼 년까지는 아니지만 뭐, 곁눈질로 익혀서 관상을 좀 본다고 했다. 관상을 보면 상대방 인생도 더러 보이고 뭐, 재미있다고 했다.
관상이 별로라고? 상념 더해져
10월은 시가 아른거리는 詩月
"관상이 운명의 지도라면, 그건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말인데, 바뀌는 것은 아닐까?"
선생님은 영화도 안 보셨나 봐. 계속 지렁이젤리만 물컹물컹 흐느적거린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제 고향인 강원도에 계시는 할아버지 친구 한 분도 이마가 굉장히 좁아서 관상으로 치자면 마흔 살을 못 넘길 상인데,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이마가 넓으신 우리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를 여태 좋아하신다네요."
하하하, 깔깔깔….
다시 수업을 시작한다. 아, 지금은 10월이지. 하여, 쉬어 갈 겸, 학생들에게 '시월'을 한자로 써 보라고 했다.
"'시월'을 '十月'로 쓴 사람은 '시 창작 실습' 수업 들을 자격이 없겠네."
순간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감추질 않는다.
"시를 쓰는 우리들에게 '시월'은 '詩月'이겠지?"
아하, 학생들의 얼굴이 환해진다. 나에게 10월은 '詩月'이다. 왜냐하면 '시월∼', 발음이 같아서인지 10월에 유난히 시가 가슴에 아른거리고, 개인적으로 10월에 시가 우우 몰려서 창작되기 때문이다. 물론 시가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겠다. 그러나 한 편의 시가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고 힘을 준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렇듯 마음밭의 이랑과 고랑을 살피는 일이 정해진 운명이라 여겨지는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 또다시 관상이 마음 쓰인다. 만약 한 사람의 삶을 다복하고 행복하게 해 주는 좋은 관상이 존재한다면 그 의미 있는 관상을 우리가 마음밭을 일구는 시 속에서 구현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제가 이번에 쓰려는 연작의 시적 화자로 젠틀한 악역이 어떨까 해요."
그 녀석은 '관상' 연작시를 쓸 예정이란다. 젠틀한 악역이라? 문득 그것의 관상이 궁금해진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채로 기품 있으되 변화무쌍한 시적 화자를 창조할 거란다. 그런 캐릭터는 소설이나 시나리오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선생님, 그건 편견 아닐까요? 그래, 기대한다.
이번 주말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막을 내린다. 영화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네 사피엔스(cine sapiens)'이면서 한 손에 시집을 들고 감흥의 무게를 재는 학생들. 시 품평 도중에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본 이야기를 곁들이며 시 쓰기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 나 역시 영상문화와 문자문화 사이를 오가는 마음자리 탓에, 관상 탓에, 이래저래 수상한 시월이다. 상념이 밀려드는 詩月이다.
문선영 문학평론가
동아대 교양교육원 교수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