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조선은 왜 아인슈타인에 열광했을까?
- 가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민태기
나라 없는 유대인에게 동질감
상대성이론, 독립운동 상징 인식
세상 움직이는 과학 영향력 주목
일간지 등 상세한 시리즈 기사로
조선과학자도 입체적으로 다뤄
 1922년 일본 도쿄를 방문한 아인슈타인 부부.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간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 언론들은 과학 스타 아인슈타인의 방문 일정을 시시각각 보도했다. 위즈덤하우스 제공
1922년 일본 도쿄를 방문한 아인슈타인 부부.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간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 언론들은 과학 스타 아인슈타인의 방문 일정을 시시각각 보도했다. 위즈덤하우스 제공
20세기 초 인류의 지식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현대물리학이 등장했다. 막스 플랑크가 양자역학의 문을 열었고, 퀴리가 방사능을 발견했으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으로 물리학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슈뢰딩거 등 현대물리학을 태동시킨 이들이 인류 지식의 판을 새롭게 짜던 때 우리 과학자들 역시 폭넓은 국제적 행보를 보였다.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은 시대의 아픔과 비극을 과학으로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우리 과학자들의 분투기이다. 저자는 과학, 공학, 예술, 철학을 아우르며 조선 시대 선조들의 숨은 과학사를 조명한다.
책에서 놀라운 사실을 접했다. 아인슈타인이 주요 국가에서 주목받던 1920년대 우리나라에도 상대성이론이 전해졌다는 것이다. 단순히 소개된 정도가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순회강연이 열렸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주요 일간지와 잡지들은 연이어 새로운 과학의 탄생을 지면에 올렸다. 심지어 당시로는 최신 이론이었던 양자역학도 다뤘다.
100년 전 조선은 왜 아인슈타인에 열광했을까?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은 나라 잃고 떠도는 유대인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보다 대학을 먼저 설립했다. 선조들은 대체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어떤 인물이고 상대성이론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라도 없이 대학을 세우는지 궁금해했다.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는 해외 소식을 통해 과학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가졌다는 데 주목했고, 상대성이론을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조선인에게 과학은 곧 자립이었다.
우리나라 지면에 최초로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것은 경성공업전문학교 졸업생들 주축인 ‘공우구락부’가 발간한 잡지 ‘공우’의 1920년 10월 창간호다. 이어 1921년 5월 19일 자 ‘동아일보’에 아인슈타인을 알린 최초의 기사가 실렸다.
1922년 2월 23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상대성이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됐다. 필자는 화가 나혜석의 오빠인 나경석. 도쿄공업대학 출신인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총동원해 상대성이론에 대해 무려 7편의 상세한 시리즈를 썼다. 도쿄공업대학은 나중에 노벨상을 두 명 배출하는 명문 대학이다. 나경석은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라는 점부터 강조했다. 세상을 뒤바꾼 유대인 ‘괴물’로 당시 지식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로스차일드, 레닌, 마르크스를 차례로 언급하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역시 못지않은 파괴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과학이 경제체제의 대변혁이나 정치혁명과도 같은 힘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 나경석은 천문학의 혁명, 철학상 의의, 최대 속도, 시간과 공간의 관념 등 총 5부로 나눠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자세히 소개했다. 나경석이 세계 물리학계의 최신 이론이던 상대성이론 소개에 나선 것은 당시 민족계몽의 중요성을 절감하던 지식인층이 아인슈타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100년 전 나라 잃은 민족의 부활 수단으로 인식되며 조선에 처음 알려진 상대성이론은 1922년 아인슈타인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아인슈타인 붐으로 이어졌다.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간다는 사실은 그해 6월부터 국내 언론에 알려졌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동아일보’는 1922년 11월로 예정된 아인슈타인의 도착에 맞춰 특집 기사를 기획했다. 독일 베를린에서 유학 중이던 황진남이 필자였다. 조선유학생학우회는 1923년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을 돌며 상대성이론의 순회강연을 기획했고 청중의 열기는 대단했다고 한다.
상대성이론 열풍은 문인 이광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소설 ‘무정’에서 과학의 중요성을 외쳤던 그는 1927년 6월 ‘동광’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시간 공간 및 만유인력 등 관념의 근본적 개조’라는 장문의 논설을 실었다. ‘동광’은 안창호가 주도한 ‘수양동우회’의 기관지 성격으로 1926년에 시작된 잡지다. 이광수는 이 글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다. 1920년대 초, 조선 전역을 휩쓴 아인슈타인 열풍이 이미 지나갔지만, 상대성이론을 단지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이해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국내 최초 이학박사인 천문학자 이원철, 야구 스타이자 물리학박사 최규남, 다윈의 ‘종의 기원’을 뒤집은 우장춘, 남대문시장에서 주운 미국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국제 무대에 선 수학자 이임학, 국내 첫 노벨상 후보인 양자화학자 이태규 등 다양한 조선의 과학자들을 입체적으로 다뤘다. 저자는 “우리 선조들은 결코 무기력하지 않았다. 그들은 누구보다 뜨거운 시대를 살았으며, 그들이 소개한 과학으로 우리는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불과 몇십 년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는 기적을 보여줬다”고 강조한다. 민태기 지음/위즈덤하우스/316쪽/1만 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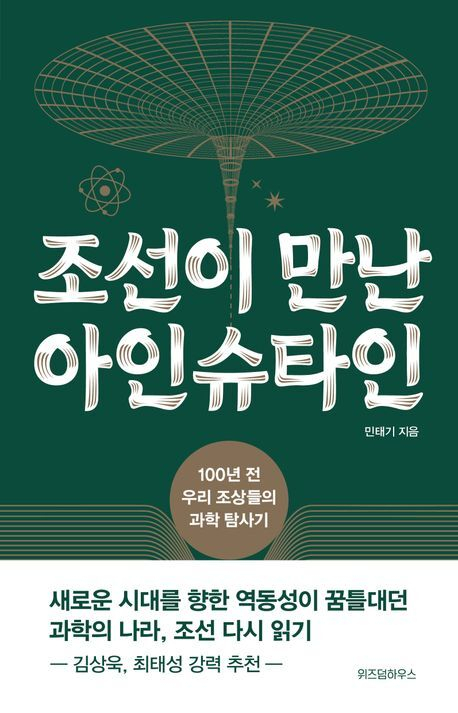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표지. 위즈덤하우스 제공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표지. 위즈덤하우스 제공
김상훈 기자 neato@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