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자원은 축복인가 재앙인가
- 가
■코발트 레드 / 싯다르트 카라
세계 코발트의 75% 공급하는 콩고
노동자의 열악한 삶 폭로한 르포
광산도 거대 자본도 책임 떠넘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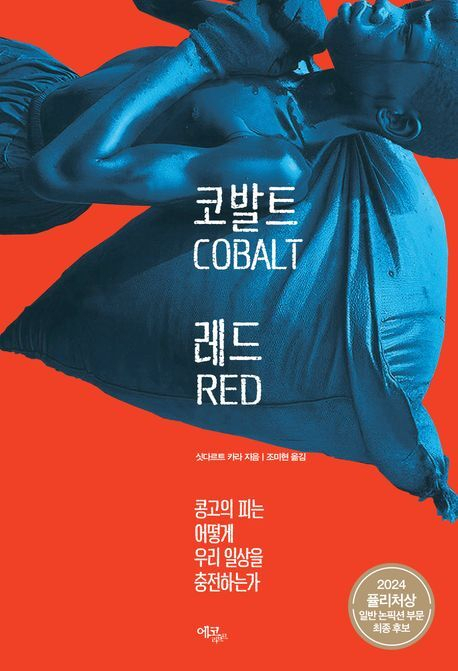 <코발트 레드> 표지.
<코발트 레드> 표지.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paradox of plenty)라는 말이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높은 확률로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빈곤을 면치 못한다. 전 세계 코발트 공급량의 약 75%를 채굴하는 콩고도 그러하다. 논픽션 <코발트 레드>는 콩고의 코발트 채굴이 콩고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생생하게 폭로한다.
코발트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전기차 등의 동력이 되는 거의 모든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의 필수 소재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세계의 여러 광산은 폐쇄됐지만, 재택 근무와 원격 수업의 확대로 코발트의 수요는 오히려 급증했다. 그리고 일당 1~2달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수십만 명의 콩고인은 보호 장비 하나 없이 구덩이와 터널로 기어들어갔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광산에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졌고,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
저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이 금지됐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18~2019년, 2021년 콩고의 광산 지역을 현장 조사했다. 여러 코발트 광산 구역 깊숙히 들어가 코발트 덕분에 살고 코발트 때문에 일하다 죽는 사람들의 증언을 생생히 기록했다.
코발트 광산 인근 주민들은 하루 종일 헤테로제나이트(코발트 광석)를 채굴하고 고작 1달러 상당을 번다. 쥐꼬리만한 임금 못지 않게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열악한 작업 환경이다. 먼지 구덩이인 채굴장은 땅을 파헤칠 때마다 흙먼지가 피어올라 사람들의 폐 속으로 들어간다. 사고 위험은 물론 각종 중금속에도 노출돼 있지만 채굴장 주변에는 변변한 위생시설조차 없다. 한 주민은 저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 무덤에서 일하고 있소.”
무엇보다 안타까운 현실은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마저 코발트 채굴에 동원된다는 점이다.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를 돕기 위해, 아이들은 학교 대신 채굴장으로 향한다.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한 아이들은 사고 가능성도 더 크다. “우리 아이들이 개처럼 죽어가고 있어요.” 코발트 채굴 현장에서 생매장돼 사망한 한 소년의 어머니가 저자를 만나 한 말이다. 여자 아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도 빈번하다. 채굴 현장에서 성폭력을 당해 아기를 낳은 10대 소녀가 아기를 업고 다시 채굴 현장으로 향한다.
책을 읽다보면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에드워드 즈윅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가 겹쳐 떠오른다. 1999년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광산의 상황도 콩고의 코발트 광산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자원의 저주는 사실 ‘아이러니’가 아니다. 자원이 많기에 주변국보다 먼저 근대 서구 제국의 먹이가 됐고, 독립 이후에는 부패한 정부가 제국을 대신해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제국이었던 서구 강국과 손잡는다. 그렇게 약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약탈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2003년 1월, 세계 40개국이 모여 분쟁 지역 다이아몬드의 유통을 방지하는 ‘킴벌리 협약’을 체결했다. 결국 자원 생산국이 아니라 그 자원을 유통하고 자원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강국과 거대 기업이 먼저 약탈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코발트 블루>의 저자 역시 말한다. “코발트에 대한 수요와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및 전기차 판매로 축적되는 막대한 수익이 없다면 코발트 때문에 피 흘리는 경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싯다르트 카라 지음/조미현 옮김/에코리브르/368쪽/2만 3000원.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