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용 앵커시설보다 주민이 피부로 느낄 콘텐츠부터 짜라 [부산형 15분 도시 진단]
- 가
4. 전문가 정책 제언
 지난달 28일 사하구 장림동 보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하호호 콘서트’가 열려 어린이와 학부모, 지역주민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하하호호 콘서트’는 주민 주도의 15분 도시 사업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지난달 28일 사하구 장림동 보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하호호 콘서트’가 열려 어린이와 학부모, 지역주민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하하호호 콘서트’는 주민 주도의 15분 도시 사업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형 15분 도시’ 조성 사업은 이제 3년차, 걸음마 단계에 있다. 공동체 중심의 ‘N분 도시’를 처음 시도한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1990년대 시작한 ‘20분 네이버후드’가 30년 이상 지난 최근에서야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부산이 15분 도시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지금이야말로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개선 방안을 찾아 과감하게 적용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부산연구원 오재환 부원장,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윤태호 교수,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 부산문화재단 이미연 대표 등 4명의 전문가가 심도 있는 제언을 쏟아냈다.
■N분 도시 핵심 본질부터 점검해야
강 교수는 “무엇보다 N분 도시가 어떻게 시작돼 확산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N분 도시 시민들은 시간을 적게 들일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걸 깨달았고,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근거리에서 걸어 다니며 생활 필수시설에서 이웃과 소소한 일상을 나눌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자연스레 변화를 넓혀갔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은 시가 주도한 공약사업으로 15분 도시가 추진되면서 순서가 뒤바뀌었다”면서 “보여주기 식 앵커시설 건립에 집중하고 있는데 보행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15분 도시 자문위원이기도 한 이 대표는 “학교 개방 등 하나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열린 개방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설을 다른 용도로 써보는 새로운 경험적 시간을 누리고 경험의 접근성을 높여야 인식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이 결국 나와 이웃이 사는 지역을 아끼고 보존하며 가꾸는 지역성과 연대성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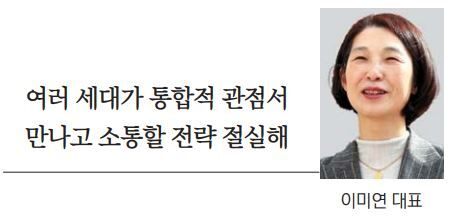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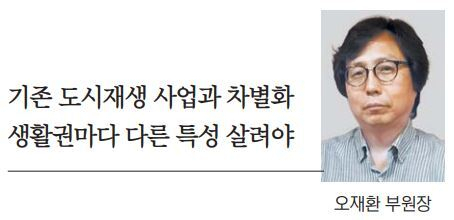
■주민 주도로 생활권 특성 살려야
이들은 관이 아닌 민이 주도하는 15분 도시로 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5분 도시 총괄자문 오 부원장은 “지금의 15분 도시가 기존에 시도됐던 다수의 도시재생 사업들과 다른 점을 찾고, 특화할 부분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상업지역, 낙후지역 등 생활권마다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리고 앵커시설도 이에 맞춰 다양화·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화명 대천천마을, 반송 희망세상 같은 주민 공동체, 육아·체육 등 지역 공동체들과 15분 도시 사업이 결합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 건강도시사업지원단 단장인 윤 교수는 “실적 중심의 형식적, 관료적 접근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실질적, 참여적 접근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주민 사이에 주체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활권 내 다양한 장소들이 공유, 활용돼야 하며, 마을건강센터와 같이 부산 전역에 운영 중인 다양한 공간이 앵커시설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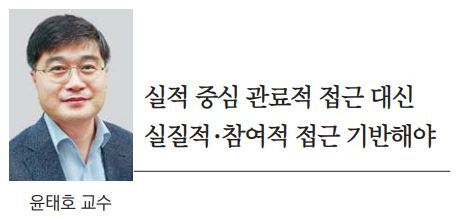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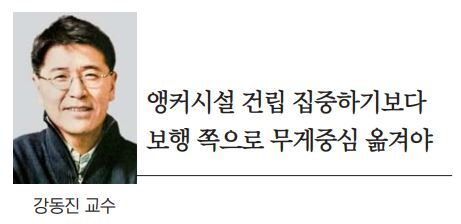
■콘텐츠 강화에 콘트롤타워 가동을
이 대표는 “보행로 정비나 공원 조성 등의 하드웨어적 사업은 잘 되고 있지만 연대성 실현을 위해 운영하는 세대별 맞춤 공간과 프로그램은 연결 지점이 다소 부족하다”면서 “통합적 관점에서 여러 세대들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들락날락의 경우 획일적인 프로그램 말고 창의적인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5분 도시 사업을 시정 전반으로 연결하고 총괄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됐다.
오 부원장은 “1개 과보다 적은 규모인 지금의 15분도시기획단으로는 시정 전체를 연결하고 관련 사업들을 꾀기엔 부족하다”며 “앞으로 국·실간 협력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각 구·군 공무원 마인드도 15분 도시가 핵심사업으로 인식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도 “임기가 정해진 부산시장 1명의 공약 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공감하고 수십 년 이어갈 수 있는 도시의 새로운 가치이자 운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