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왜 호랑이를 친근하게 느낄까
- 가
■한국인의 눈부신 철학 / 손석춘
'처용설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등
신화·설화 속 은유 살펴봄으로써
선조들의 인간적 고뇌·성찰 되새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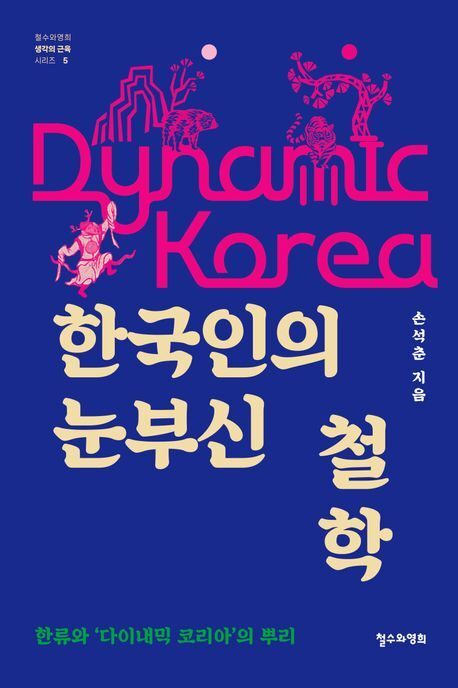 <한국인의 눈부신 철학> 표지.
<한국인의 눈부신 철학> 표지.
신화와 설화의 이면에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던 당시 시대의 특정 상황에 대한 은유(隱喩)가 숨겨져 있다. 다만 그것을 추론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꼭 집어 “이게 숨겨진 은유야”라고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신화·설화 속 숨겨진 은유에 대한 탐구는 종종 그 고증 여부를 떠나 상상의 영역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살펴보자.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이야기의 기원은 중앙아시아 인근에서 구전되는 ‘백조처녀 설화’로 알려졌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백조가 호수에 내려오면 날개 옷을 벗고 아름다운 처녀가 된다. 사냥꾼이 옷을 훔친다. 백조가 없는 지역으로 이야기가 전파되면서 우리나라에선 백조가 선녀로, 일본에선 신녀(神女)로 바뀐다. 일본의 작가 호시노 유키노부(星野 之宣)는 그의 작품 <무나카타교수전기고>(宗像敎授傳奇考)에서 백조처녀 설화의 전파를 철기문화의 전파와 연결한다.
비단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우리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에도 제각각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한국인의 눈부신 철학>은 우리의 신화·설화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모은 책이다. 저자는 그동안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을 기반으로 주제를 정하고 다듬어 책을 엮었다. 저자는 설화에 대해 “숱한 세월을 걸쳐 구전되어오는 과정에서 민중들이 스스로 동참해 보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듬뿍 담고 있는 이야기”로 정의한다.
특히나 흥미로웠던 부분은 우리 설화의 단골 등장인물(사람은 아니기에, 엄밀히 따지면 ‘인물’은 아니다)인 호랑이의 존재 의미에 관한 내용이다. 실제로 한국의 구전 이야기 중 호랑이의 등장이 얼마나 잦았던지, 중국 작가 루쉰은 한국인을 만날 때마다 호랑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아시아 대륙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호랑이는 흉악한 포식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 뿐이지만, 한국에서는 좀 다르다. 단군신화에서부터 이미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라 사람이 되려다 실패한 존재, 그래서 속정 깊은 민중들은 불쌍한(?) 호랑이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호랑이와 곶감’에서만 봐도 얼마나 어리석고 애처로운가.
책은 여러 호랑이 설화 중에서도 이른바 ‘효자 호랑이’가 등장하는 두 편에 관심을 보인다. 첫 번째 ‘호랑이로 변한 남편’ 설화는 밤마다 호랑이로 변신해 개를 잡아 그 간을 병든 어머니께 드리는 아들의 이야기이다. 두 번째 ‘효자가 된 호랑이 형님’ 이야기는 산에서 호랑이에 잡힌 남자가 호랑이에게 ‘당신은 예전에 죽어서 (호랑이로) 환생한 나의 형’이라고 속였더니, 호랑이가 남자의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더라는 내용이다.
책은 첫 번째 이야기 속 ‘병든 어머니를 둔 가난한 아들’을 100여 년에 걸쳐 골골샅샅 일어난 봉기에 가담한 민중으로 해석한다. 낮에는 관의 감시를 피해 은신하고 밤에 은밀히 활동에 나섰던 점에서 밤에만 호랑이로 변신하는 이야기로 비유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의 호랑이 역시 실제로 산에 은거하며 민란 세력에 가담한 아들의 이야기로 풀이한다.
물론 단순히 ‘내(저자) 생각에는 이런 것 같다’는 식은 아니다. 해석에 대한 다양한 사료와 정황적 근거도 함께 제시한다. 이 글에 그 논거를 다 풀어내려면 원고량이 수 배는 더 늘어나야 할 터라 생략하지만, 책을 차분히 읽다보면 저자가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책은 그 외에도 ‘단군신화’와 ‘처용설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아기장수’ 같은 익숙한 설화에 대해서도 그 속에 담긴 은유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인간적 고뇌와 성찰을 살핀다. 손석춘 지음/철수와영희/360쪽/2만 2000원.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