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으로 세상 읽기] 14. 한민족 최고 기행문 ‘열하일기’
- 가
수레로 연경 가는 연암의 꿈, 유라시아 횡단열차로 이어지다
 <열하일기>는 최고의 기행문이자 조선의 대외 전략과 이용후생의 혁신정책이 담긴 실용서이기도 하다. 연암 박지원의 초상. 부산일보DB
<열하일기>는 최고의 기행문이자 조선의 대외 전략과 이용후생의 혁신정책이 담긴 실용서이기도 하다. 연암 박지원의 초상. 부산일보DB
여름은 여행의 계절이다. 무더위를 핑계 삼아 일상에서 이탈한 여행자는 낯선 세상에서 호기심도 충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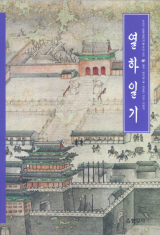
고 자신을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다. 유람의 체험을 복귀한 삶에서 되살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연암(燕巖) 박지원(1737~1805)과 〈열하일기(熱河日記)〉는 그런 점에서 최상의 여행자이자 최고의 기행문이다. 연암은 청나라 황제의 생일 축하 사절단에 끼어 왕복 6000리 여정에서 만난 사람과 접한 문물을 남김 없이 기술한다. 즐겁고 유익했던 이국의 견문을 ‘한때’로 흘려보내지 않고, 지금 우리 실정에 맞게 재현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특히 사회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며, 심경을 토로한 기록은 지식인의 자기성찰이라는 측면에서도 귀중하다.
6000리 여정의 인정·문물 담은 백과사전
국제 역학관계 분석에 대외정책 제안까지
‘청나라=오랑캐’ 탁상공론 예리하게 지적
19세기 개화·개혁 초석 마련에 큰 역할
‘갓 쓴’ 여행객의 관심은 전방위다. 교과서에 실렸던 ‘일야구도하기’나 요술쟁이의 술법을 구경한 ‘환희기’는 인식론을 방불케 한다. 소리, 빛깔에 현혹되면 똑바로 보고 듣는 힘을 잃어버려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 속게 된다는 것이다. 오랑캐 청(淸)을 멸시하고 징치하자는 북벌론을 은근히 야유하는 시사평론이 나오는가 하면 지구 자전설을 풀이하는 과학이론도 소개된다. 연암의 백과사전적 지식이 26권 10책의 방대한 내용으로 전개되지만, 유려한 문체와 독특한 착상 덕에 한번 손에 잡으면 도중에 놓을 수 없을 정도다.
 연암의 아들이 쓴 <열하일기> 필사본
연암의 아들이 쓴 <열하일기> 필사본
아이로니컬하게도 〈열하일기〉는 실용서다. 여행기의 형식을 취하지만 수개월의 현지 관찰을 통해 조선의 대청(
對淸) 전략과 이용후생의 혁신정책을 담고 있다. 제목에 ‘열하’가 들어간 것이 의미심장하다. 황제를 만나러 북경에 갔지만 그는 피서지인 열하로 떠났다. 한데 북경보다 기온이 고작 1~2도 낮은 열하가 왜 황실의 바캉스지일까. 박지원은 휴가도 전략이라고 파악한다. 전략적 요충지인 열하에서 황제가 몇 달을 보내는 것은 위협 세력인 몽골족에 대한 군사적 시위이자 훈련이라는 것이다. 열하 행궁 부근에 몽골족이 신봉하는 라마불교의 사원을 지어주는 것은 유화적 제스처다. 연암은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청의 스마트 파워를 주목하면서 당시 국제 정세를 객관적으로 상세히 분석한다. 가뜩이나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가적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이 시점에 200여 년 전 〈열하일기〉가 여전히 유효한 대목이다.
특히 책에 수록된 ‘허생전’은 소설 형식으로 포장한 대외전략론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남산골에 사는 은둔거사 허생은 임금의 총신인 이완에게 조선의 대외정책을 조언한다. 왕실이나 명문가의 여성을 명나라의 유민과 혼인시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대부 자제를 청으로 유학 보내 교류를 장려하라는 제안이다. 존화양이(尊華攘夷)의 조선 위정자에게는 백일몽이었을 것이다. 국제정치학자 하영선은 허생의 아이디어를 청과의 관계 설정을 위한 소프트 파워와 네트워크 외교의 일환으로 높게 평가한다. 당시 국제적 역학관계로 공상소설에 가깝게 된 북벌론 대신에 강대국 청과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연암 박지원이 갔던 여정
연암 박지원이 갔던 여정
연암은 ‘청나라=오랑캐’로 가득한 권력자의 탁상공론 또한 여지 없이 박살낸다. 삼류 선비를 자처하는 그는 중국 여행의 제일 장관으로 ‘깨진 기와’와 ‘똥거름’을 꼽았다. 깨진 기왓장을 내버리지 않고 담장을 장식하니 마을마다 아름다운 경관이 연출되고, 거름으로 쓰려고 쌓아올린 분변의 맵시에서는 문물의 진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개돼지나 다를 바 없는 ‘되놈’에게 볼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일류 선비’와는 사뭇 다르다. 연암은 ‘법이 좋고 제도가 아름다우면 오랑캐라 할지라도 배워야 한다’는 입장. 이적(夷狄)의 왕조조차 나라에 유용하다면 무엇이든 제 것으로 삼는데, 백성에 이롭고 국가에 쓸모 있는 법제와 습속을 본받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의 혁신적 인식은 수레로 이어진다. 제자인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연암 또한 수레를 쓰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부국부민의 핵심 도구를 수레로 본다. 크지 않다고 해도 3000리는 되는 조선 땅의 삶이 빈한한 이유는 각 고장의 많은 물산을 유통할 수 있는 수레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이자 지식인인 양반과 선비가 공허한 관념론에만 빠져 실질적인 방책을 강구하지 않아서 수레가 다니지 못하고 그 결과 가난해지는, 즉 이용(利用)이 되지 않아 후생(厚生)할 수 없는 사정을 설득력 있게 풀이한다. 그러나 국망의 기로에 서 있던 당대에 연암의 혁신적 구상은 불온시됐다. 소중화(小中華)의 망집에 빠져있던 권력자는 〈열하일기〉의 파괴력을 우려해서 문체로 꼬투리를 잡았다.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책이 정식 출간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 돌려 읽혔던 까닭이다. 그래도 그의 사상은 제자와 후손에게서 되살아났다. 손자 박규수는 19세기 개화파의 사상적 대부가 되어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을 길러냈다. ‘젊은 그들’은 박지원이 직접 연경에서 구해온 둥근 지구본을 돌리면서 ‘어느 나라든지 가운데로 오게 돌리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에 경천동지의 감격을 느꼈다. 물론 연암의 이용후생은 좌절되고, 개화파의 시도도 무위로 끝났다. 그러나 말세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첫 삽을 뜬 연암이 있었기에 개화와 개혁의 초석이 마련됐다. 바퀴달린 수레로 한양에서 연경(베이징)까지 다니자던 박지원의 꿈은 오늘날 부산에서 파리까지 대륙을 관통하자는 유라시아 횡단 열차의 현실로 바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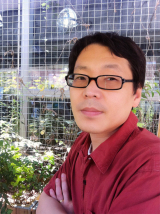
정승민
교양 팟캐스트 ‘일당백’ 운영자
※이번 기획은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연재합니다.
박진홍 기자 jhp@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