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 모습과 전망 담은 지역 학자들의 ‘빛깔 있는 저작’
- 가
김학이 동아대 교수 ‘감정의 역사’
16~20세기 근현대 감정사 분석
유형근 부산대 교수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대기업 노조 시대적 변화 추적
양세욱 인제대 교수 ‘문자, 미를 탐하다’
문자 예술 통해 동아시아 미 탐색
손성준 한국해양대 교수 ‘중역한 영웅’
한국의 중역 텍스트 통해 동아시아 전망
상당한 공력이 들어간 지역 학자들의 빛깔 있는 책들이 출간됐다. 그 빛깔의 분광 속에 우리 시대 모습과 전망이 어른거린다.
 김학이 동아대 사학과 교수의 <감정의 역사>. 푸른역사 제공
김학이 동아대 사학과 교수의 <감정의 역사>. 푸른역사 제공
김학이 동아대 사학과 교수의 <감정의 역사>(푸른역사)는 서양 학계에서 2000년대 들어 본격 연구되기 시작한 신생 분야인 ‘감정사’의 520여 쪽 저작이다. 감정사는 감정에 시대별 ‘감정 레짐’이라는 분명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16세기 루터에서 20세기 나치에 이르는 독일 근현대 감정사를 전쟁일기, 자서전, 소설 등을 통해 실감 나게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감정에 역사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분노’는 중세~16세기 신과 권력자의 전유물에서 18세기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반인의 감정이 된다는 것이다. ‘신뢰’와 ‘충성’은 16~18세기 종교·도덕·가족적 감정이었으나 19세기 들어 ‘생산자원’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때 나온 슬로건이 ‘노동의 기쁨’이었다고 한다. 1970년대 이후 ‘따스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핵심으로 대두해 의사와 약, 화학실험실에 의해 조절되기도 하는데 이는 어쩌면 우리가 인간 본질과 맞지 않는 문명 속에 살기 때문이란다.
우리 당대를 보면 1980년대 신자유주의는 ‘개별화’를 심화시켰고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는 ‘불확실성’을 강화했다고 한다. 개별화되고 불확실해진 우리 시대에 인간을 묶는 기제가 ‘공감’인데 공감에의 호소는 허무맹랑해서 개인은 내적으로 격발하면서 공감이 아니라 혐오를 작렬시킨다는 것이다. 헛된 공감사회의 구호가 혐오사회를 부추긴다는 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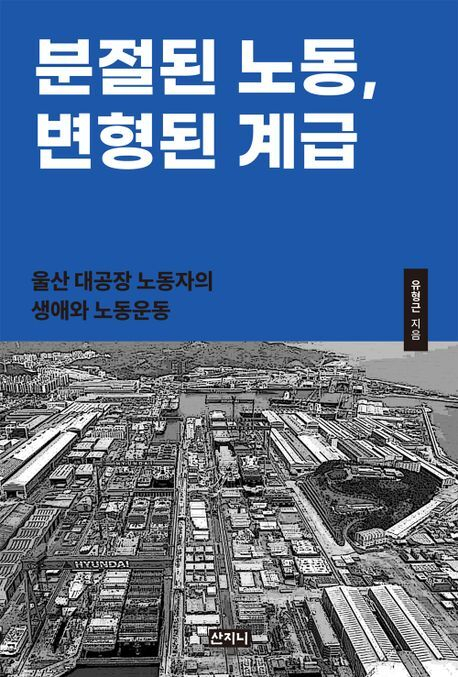 유형근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의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산지니 제공
유형근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의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산지니 제공
유형근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의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산지니)은 전체 노동계급에서 분절되면서 이질화로 나아간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1990년대 이후 시대적 변화를 세밀하게 추적한 510여 쪽 책이다. 대기업 노조 운동은 계급 연대보다는 기업 내 임금 투쟁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변형했다는 것인데 신분 상승과 중산층화된 생활세계, 자신만의 배타적 이해를 좇아가면서 치명적으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조직적 배제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 대기업 노동자들은 계급 파편화냐 계급 재형성이냐의 갈림길을 거쳐온 것으로 보면서, 전 세계적 수준에서도 노동운동 위기를 반전시킬 동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으로 새로운 주체 형성과 연대 창출이 지난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세욱 인제대 국제어문학부 교수의 <문자, 미를 탐하다-동아시아 문자예술의 미학>(서해문집)과 손성준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교수의 <중역한 영웅>(소명출판)은 동아시아적 전망을 추구하는 저작이다.
 양세욱 인제대 국제어문학부 교수의 <문자, 미를 탐하다-동아시아 문자예술의 미학>. 서해문집 제공
양세욱 인제대 국제어문학부 교수의 <문자, 미를 탐하다-동아시아 문자예술의 미학>. 서해문집 제공
양세욱 교수의 520여 쪽 책은 ‘글씨’를 통해 동아시아가 공유한 미를 탐색한다. 그 탐색은 미적 대상·사건에 담긴 동아시아인의 삶과 꿈, 생각과 요구를 읽어내는 일이며,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서구에 의해 찢긴 근대를 넘어서는 일이 될 거라고 한다. 중국은 서법, 일본은 서도, 한국은 서예라고 부르는 ‘글자 쓰는 행위’를 예술로 발전시킨 지역은 동아시아가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저자는 “문자예술을 조명하는 일은 한가한 복고 취향이 아니다”며 “그것은 한국, 나아가 아시아 미의 현재를 성찰하고 그 미래를 가늠하기 위한 동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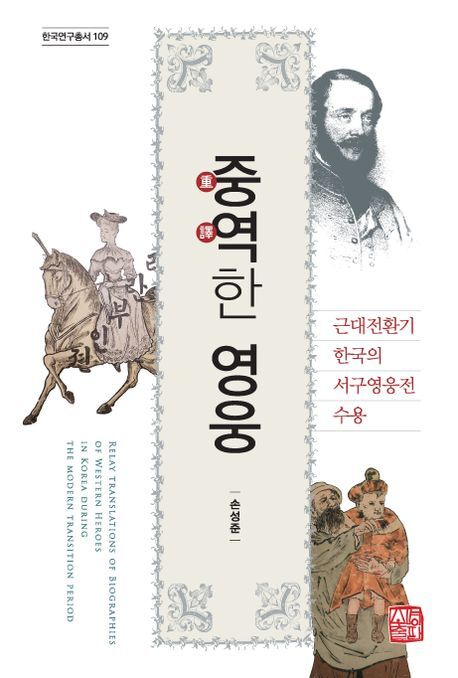 손성준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교수의 <중역한 영웅>. 소명출판 제공
손성준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교수의 <중역한 영웅>. 소명출판 제공
손성준 교수의 책도 동아시아 안목의 580여 쪽 저작이다. 19세기 말~20세기 초 동아시아의 서구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서구영웅전인데 한국의 중역(重譯) 텍스트는 일본과 중국을 거친 ‘동아시아 최종 텍스트’였다는 것이다. 중역은 당대 지식문화를 재구축한 거의 유일한 방식으로, 번역 주체의 능동적 수행을 환기한다는 것이다. 서구영웅전은, 민중이 정치적 혼돈 속에서 국가를 위해 ‘영웅’처럼 ‘애국자’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았던 근대전환기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텍스트라는 것이다. ‘번역의 시대’이자 ‘영웅의 시대’에 서구영웅전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모르는 근대’에 대한 동아시아적 지적 대결이었다는 것이다.
최학림 선임기자 theos@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