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 유전자의 경쟁보다 협력이 인류 문명 만들었다
- 가
문명의 자연사 / 마크 버트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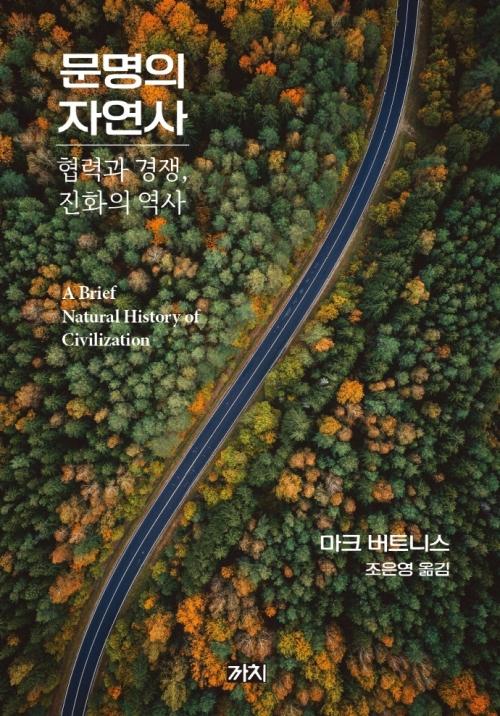
<문명의 자연사>는 이기적 유전자의 ‘경쟁’을 넘어선 ‘협력’의 힘이 자연의 본질에 가까우며, 그것이 결국 인류 문명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펴는 책이다.
다윈의 자연선택설 이래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진화의 근본 동력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이 책은 경쟁과 함께 ‘협력’이 생명체 진화를 추동해왔고, 인간의 문명을 만들었다는 새로운 미래적 관점을 제시한다. 인류 문명은 ‘경쟁’과 ‘협력’이 작동하는 거대한 자연사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목 <문명의 자연사>의 뜻이다.
진화는 종 내부·종들 간 협력하도록 작동
모든 종과 생태계 함께 살도록 선택해야
저자에 따르면 원시 원핵세포가 서로 협력하면서 진핵세포로 나아갔다. 이를 위해 원핵세포는 자신의 독립성과 이기적인 개별 유전자의 동인을 포기했다고 한다. ‘생존을 위한 포기’가 곧 협력이자 협력적 조직화이며, 이를 통해 복잡한 유기체로 나아갔다는 거다. 그다음 단계로 진핵세포는 미생물과의 협력으로 다세포 생물이 되었고, 다세포 생물은 협력적인 초유기체로서 환경에 더 잘 적응했다는 거다.
그런데 진화의 역사는 종 내부와 종들 사이에서도 협력을 하도록 작동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벌이 떼를 이뤄 커다란 포유류를 제압할 수 있고, 작은 물고기 떼가 산호초에서 잘 방어된 섭식 세력권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인간 조상이 원시적인 무기와 길든 늑대로 사나운 포식자나 다른 호모종 집단을 지배했던 것도 같은 이치다. 이런 것들은 모두 ‘협력’으로 이루어낸 발전 사례라는 거다. 이런 기재가 작동하면서 인류는 본격적으로 가축을 길들이고 정착과 농경을 시작했다. 자연을 길들이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인류는 문명을 탄생시킬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농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알고 보면 인간이 단독으로 이뤄낸 것도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진화의 수레바퀴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뤄진 거라는 말이다. <총, 균, 쇠>를 쓴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농업혁명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사회적 성적 불평등, 질병과 폭정을 가져온, 우리가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한 재앙”이라고 했다. 저자도 “농업은 혁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진화적 함정, 인간 식물 동물 사이에서 발달한 의존성과 상리공생이 만들어낸 자연적 수순”이라고 본다.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자연사였다는 거다. 그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은 또 진화했다는 거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 인류는 진화의 과정을 가로채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세상을 주무르는 종이 된 거다. 지구의 ‘열린 계’를 ‘닫힌 계’로 만들 정도로 확산했다고 한다. 현재 인류는 협력적 상리공생의 생태계를 망가뜨리면서 극으로 치닫는 ‘파괴의 고통’을 스스로 서서히 감지하고 있다. ‘불타는 지구’의 심각한 기후 위기가 그것이다. 그리고 인간을 새로운 단계로 밀어올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인공지능을 마주하고 있다. 저자는 주장한다. “우리는 협력의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모든 종, 지구 생태계와 함께 살고 진화하겠다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다.” 마크 버트니스 지음/조은영 옮김/까치/360쪽/2만 원.
최학림 선임기자 theos@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