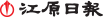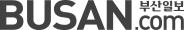“동학년에서 세월호까지 억울한 영혼 위로”
 1993년 등단해 30년이 넘는 시력(詩歷)을 지닌 박정애 시인이 열 번째 시집 <물꽃>을 출간했다. 박정애 시인 제공
1993년 등단해 30년이 넘는 시력(詩歷)을 지닌 박정애 시인이 열 번째 시집 <물꽃>을 출간했다. 박정애 시인 제공
‘갑오동학, 기미 3·1정신부터 4·19, 부마항쟁, 5·18/유월의 목소리로 푸른 강물이 되기까지/논밭을 가꾼 건 민초들이었으니/삽자루 조선 육철낫 죽창을 깎아들었으나/민중항쟁은 언제나 순결한 맨손 맨발로/촛불을 들었고 눈을 뜨고도 보이지 않는/어둠을 밝히는 등댓불처럼/꽃길을 밝혀들었다.’(‘레퀴엠 10-1979년 10월의 바리케이드’)
박정애 시인이 열 번째 시집 <물꽃>에서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을 위로하는 사제로서의 새 면모를 선보였다. 1993년 등단해 30년이 넘는 시력(詩歷)을 지닌 박 시인은 2009년 낙동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 황지 연못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낙동강 물길을 따라 17박 18일 동안 도보 순례를 하는 등 그동안 ‘걷는 시인’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집에서도 ‘나무가 걸어온 길’, ‘발원지에서-금강’, ‘백마강 달밤’, ‘가덕도 동백숲’, ‘암벽타기’, ‘나무의 기원’ 같은 시편에서는 자연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마음이 엿보인다. ‘추녀 아래가 쇠창살이라 비가 그칠 때까지/나는 흑맥주나 마시며 오늘 떠날 걸 내일로/오늘 죽을 걸 내일로 미뤘다/그래야 될 것 같았다.’ 시인으로서의 낭만이 엿보이는 ‘우기(雨期)’ 같은 시도 있긴 하다.
하지만 꽤 두꺼운 시집 <물꽃>은 3부에 수록된 레퀴엠 17편이 절정이자 핵심이라 하겠다. 동학년에서 제주 4·3을 거쳐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안타깝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위한 시편들이다. 황선열 문학평론가는 “죽은 자의 영혼이 첫눈이 되어 내리고, 봄 산을 물들이는 진달래가 되고, 바람의 비문이 되어 다가온다”라고 평했다.
박 시인은 이처럼 다수의 레퀴엠을 지은 배경에 대해 “행사 때문에 서대문형무소를 갔다. 붉은 벽돌의 바람벽에 등을 기댔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섬망에 들어 헛것들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이곳을 견디고 간 사람들이나 이곳에서 목숨을 다한 사람들이 남긴 비명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라고 털어놓았다.
‘레퀴엠 9-유월, 초록 함성으로’에는 ‘새도 입이 얼어 울지 못하던 겨울 새벽/외롭게 언 강을 홀로 건너던 청년을/꽃의 이름으로 불러본다/종철아’라는 대목이 나온다. 알고 보니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고모가 박 시인이다. 박 시인은 “철이는 집안의 꿈나무여서 그가 하는 말에 늘 귀를 기울였다. 철이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다 어두운 곳에 우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아프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편인 ‘레퀴엠 17-낯선 저녁’에는 ‘각각의 방으로 들어가 우두커니/누구도 불을 켜지 않는 검은 적막 속/정말 이 상황이 현실인가/선뜻 받아들이지 못한/어정쩡 낯선 외계의 저녁’이란 표현이 나온다. 마치 지난 연말 비상계엄 상황을 묘사한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레퀴엠 10’은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닦고 닦아야 빛나는/청동거울이라서 선열의 영령들까지도/응원하고 격려하였다’라고 선언해서다. 박 시인은 “시가 사회가 되고 정치가 되는 세상이 되기를, 시가 사람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삶이 외롭다는 사람보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 되기를, 따스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단에 제물을 올리듯 정중하게 예를 다하려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집은 4부 총 89편의 시편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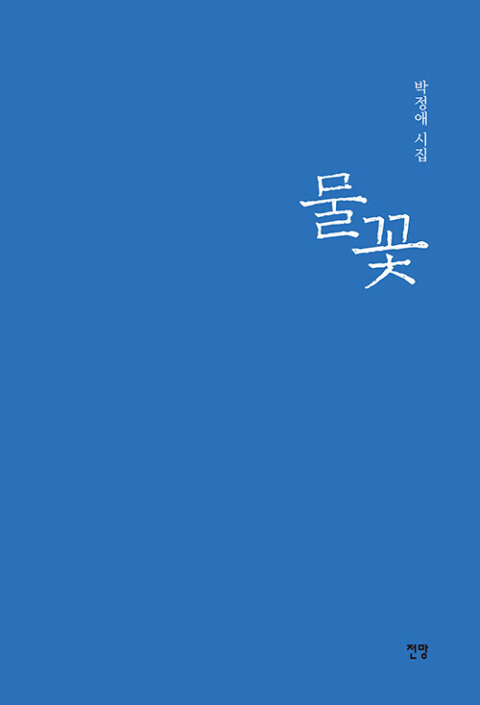 <물꽃> 표지.
<물꽃> 표지.
관련기사
# 실시간핫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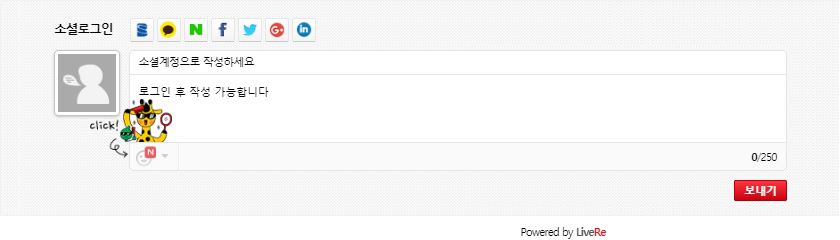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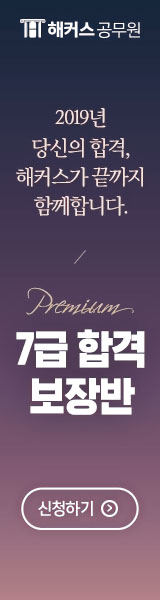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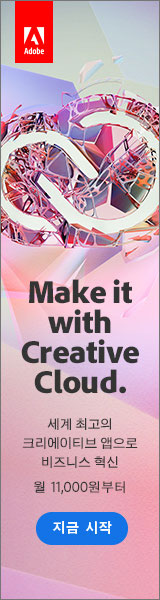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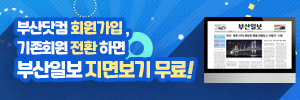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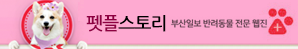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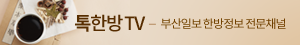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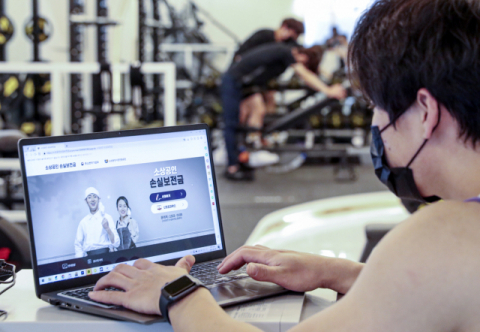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