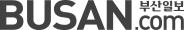[2026 신춘문예] 내 문장이 너에게 닿기를… 다시 ‘문학의 시대’
 2026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자들 얼굴에선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다. 왼쪽부터 동시 류한월, 평론 김형식, 희곡 김재은, 시조 최애경, 시 박은우, 단편소설 윤현준. 이재찬 기자 chan@
2026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자들 얼굴에선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다. 왼쪽부터 동시 류한월, 평론 김형식, 희곡 김재은, 시조 최애경, 시 박은우, 단편소설 윤현준. 이재찬 기자 chan@
2026 부산일보 신춘문예에는 사상 최다 작품이 접수됐다. 전반적으로 수준이 고르게 우수했고, 치열하게 쓴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분야별 최종 심사에 오른 작품들은 심사위원들이 격론을 벌일 정도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2026 부산일보 신춘문예 선정작은 “당장 무대에 올리거나 출간해도 될 정도”라는 호평이 나올 만큼 수준이 높았다. 6개 부문 당선자는 20대가 1명, 30대가 2명, 50대가 3명으로 연령대도 고른 편이었다. 부산일보 신춘문예를 거쳐 이제 막 문단에 정식 데뷔한 6명의 당선자를 만나 그들의 문학 이야기를 들었다.
시 - 박은우
“세상의 가능태 상상하고 나의 언어가
가능의 영토 누추하게 만들지 않게 노력”
시 부문은 응모작 수로만 따지면 매년 독보적인 1등이다. 그 치열한 경쟁에서 50대 박은우 씨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했다. 시를 좋아하던 독자였던 그는 어느 순간 내가 직접 써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박 씨는 “처음엔 수사가 과하고 감정이 넘쳤다. 그게 멋있는 글이라 착각했다. 그러다 나만의 사유를 담지 않고서는 기성품과 다를 것과 없다는 걸 깨달았다. 기꺼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라고 고백했다. 이번 신춘문예는 마감 하루 전에 겨우 접수했는데, 1년 내내 머릿 속에 맴돌던 문장 몇 개를 정리해 시로 완성했기에 속이 후련한 기분이었다.
박 씨는 “세상의 가능태를 상상하고 나의 언어가 그 가능의 영토를 누추하게 만들지 않도록 애쓰겠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조차 시의 한 문장처럼 밝혔다.
단편소설 - 윤현준
“참사 기록하고 표현하며… 슬픔 애도”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되기 목표로
소설 당선자 윤현준 씨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다. 스무 살 때부터 일 년에 수십 편의 습작을 쓸 정도로 글쓰기에 빠졌다. 윤 씨는 “여전히 안타까운 참사가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슬펐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이 슬픔을 애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누군가에게 새겨지는 밑줄 친 문장이 자신의 것이라면 보람찰 것 같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으로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시조 - 최애경
“굽은 등 수선사 보며 세월 흔적 느껴
정형 속에서 적확한 단어 찾는 희열”
시조 당선자 최애경 씨는 많이 참고, 할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눈치 안 보고 말할 수 있는 수단이 글이었고, 글을 쓰며 혼자 대화하는 게 익숙한 버릇이 되었다. 당선작 ‘방아쇠 수지’는 남편의 손가락 수술에서 출발했다. 마침, 시장 뒤 수선실에서 굽은 등의 수선사를 보며 노동의 고단함, 세월의 흔적을 느꼈고 이번 작품이 탄생했다.
최 씨는 “시조의 매력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정형의 틀이 있어 처음에는 생소하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정형 속에서 적확한 단어를 찾는 순간 환희와 희열이 크다. 시조만이 갖는 품격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일보 시조 당선 소식을 듣고 며칠 후 다른 작품으로 중앙지 신춘문예에도 당선돼 2관왕이 되었다. 최 씨는 “내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작품을 부산일보에 보냈다. 그 어떤 곳보다 부산일보에 꼭 당선되고 싶었다. 그래서 당선 소식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라고 전했다. 딱 하루만 기뻐하고 계속 정진하겠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올해 아동문학은 동시에서 탄생했다.
동시 - 류한월
“아이처럼 돌멩이도 다시 보는 법 배워”
매일 동시 하나 쓰는 성실한 기록자 꿈
동시 당선자 류한월 씨는 50대 후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전문가로서 현재도 1인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다. IT업계 칼럼을 10년 이상 게재하고 있을 정도로 IT와 글쓰기 두 분야를 자유롭게 오간다. 문학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오직 독학으로 시작하다 보니, 류 씨는 장르의 구분 없이 문학의 모든 장르가 그저 글쓰기로 다가왔다.
중앙지 신춘문예에 시조로 당선된 적이 있고, 시와 수필로 지역의 크고 작은 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동화를 출간한 적도 있다니 그야말로 장르를 가리지 않는 작가인 셈이다. 류 씨는 “공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어른은 목적지만 보고 걷지만, 아이들은 돌멩이도 본다. 다시 돌멩이를 보는 법을 배우자 싶어 동시를 쓰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류 씨는 이어 “동시를 쓰려면 무릎을 굽혀야 한다. 개미의 눈과 마주하려면 땅에 엎드려야 하고, 꽃의 향기를 맡으려면 고개를 숙여야 한다. 끊임없이 오르려 하는 세상의 속도와 반대로 아래를 보고 멈춰 서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 그게 바로 동시의 매력이다”라고 소개했다.
거창한 계획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매일 하나의 동시를 쓰는 성실한 기록자가 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희곡 - 김재은
“글로 끝나지 않고 재창조 거쳐 ‘재미’
내 희곡 직접 무대 올리는 날 기다려”
30대 초반의 프리랜서 공연제작 프로덕션 매니저(PM)로 연극 현장을 늘 지키던 김재은 씨는 올해 희곡 부문 당선자가 됐다. 심사위원들이 이 씨의 희곡에서 연극의 흐름과 무대의 특성을 잘 아는 현장 사람일 것이라는 추측했는데, 역시 그랬다.
워낙 어릴 때부터 다양한 장르의 책을 좋아했고, 고등학교를 문예창작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시작했다. 김 씨는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보고 싶은 세상이 많았다.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글로 표현하게 됐다. 졸업 후 공연 현장에 뛰어들었지만, 틈이 날 때마다 글을 쓰며 내 인생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댄스스포츠 영상을 보다가 뭔가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고, 이번 작품에 그 감정을 담게 되었다고 한다.
김 씨는 “희곡은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연출 스태프 배우를 거쳐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고, 같은 대본이어도 연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재창조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다”라고 밝혔다. 자신이 쓴 희곡을 직접 무대에 올리는 날을 기다리며 계속 글쓰기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평론 - 김형식
이론·현실 자유롭게 오가기 마음 뺏겨
“글쓰기는 세계·타자와 소통하는 수단”
올해 평론 분야 당선자 김형식 씨는 30대 후반으로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글 쓰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조금 늦은 출발인 것 같다고 말하는 그는 특히 이론과 현실,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자유롭게 오가는 평론에 온 마음을 빼앗겼다.
김 씨는 “나에게 글쓰기는 세계와 타자와 닿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글을 통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그에게 신춘문예는 애증 같은 존재이다. 2016년 신춘문예에 도전했지만,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글쓰기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다시 도전을 시작했다.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고 난 후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쓴 글이 당선작이다.
김 씨는 “영화 평론의 매력은 동시대적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동시대적 평론가는 무엇보다 현재의 기대를 살피며 과거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다. 과거로부터 새로운 자원과 물을 길어 올려 현재를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했다. 평론에 관해 확실한 자신의 철학이 있었다.
2026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은 오는 8일 오후 4시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시상식 현장에선 당선자들의 소감을 직접 들을 수 있다.
관련기사
# 실시간핫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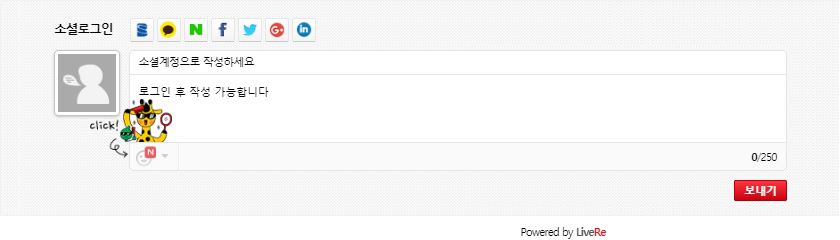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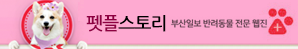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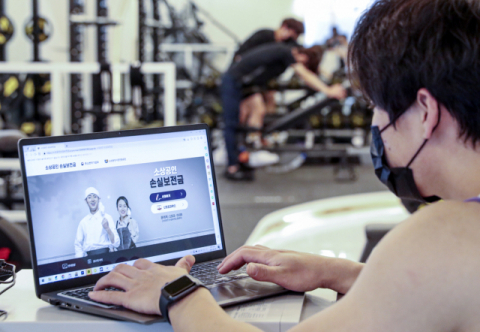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